대체로 有는 '있을 유'로 읽는다. <한자사전>은 그 첫 번째 뜻으로 '있다'를 제시한다. 예컨대, ‘사유종시’(事有終始)는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다.’로 옮긴다. 주어에 해당하는 ‘사’를 부사처럼 ‘일에는’으로 옮겼다. 중고시절 영어 시간에 어느 선생님은 영어 문장의 주어가 무생물이면 그 주어를 부사처럼 풀이하라고 가르쳤다. 영어 구조와 한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있다'는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다. 나는 글짓기 할 때 '있다'를 쓰지 않으려고 무척 낑낑댄다. '일물일어'(一物一語)를 생각한다. 그 상황에 딱 적합한 술어를 찾으려고 애쓴다. '있다'는 말을 대신할 다른 말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한다. ‘있다’를 밥 먹듯이 쓰다 보면, 언어생활에서 술어는 ‘있다’ 하나만으로 부지불식간에 굳어진다. 술어가 적합하지도 다양하지도 않은 글은 그 필자가 나타내고자 한 뜻이 독자에게 잘못 전해질 위험이 적지 않다. 그런 글은 독자의 많은 수고를 요구한다. 헛수고가 아니면 다행이겠다.
'있다'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존재(存在)한다. '나는 여기 있다.'는 '나는 여기 존재한다.'로 풀어진다. 存은 '있을 존', 在는 '있을 재'이다. '존재'는 '있고 있다'는 뜻이다. 글자는 다르나 사실상 동어반복이라 헛갈린다. 두 번째, 가지다. '있는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나 대체로 '돈 많은 사람' , '많이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세 번째, 어떤 상태의 진행이나 계속을 나타낸다. 예컨대, 회의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나는 '회의 중이다', ' 방황 중이다' 등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네이버 한자사전>을 보니, 有={月, 又}. 뜻을 나타내는 부수 달월(月; 초승달)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 (又의 변형)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여기서 又는 ‘또 우’로보다는 ‘오른손 우’로 읽어야 편하다. 글자의 성분 月을 초승달로 보면, 有는 오른손으로 초승달을 잡는다는 뜻으로 풀어진다. 납득하기 어렵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有를 회의문자로도 풀어놨다. 有는 月(육(肉)달 월)과 又가 결합한 글자이다. 有의 금문(金文)은 마치 고기를 손으로 잡아 쥔 듯한 형태이다. 따라서 有는 ‘소유하다’, ‘존재하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리고 有자의 부수 月은 달월보다는 육달월로 풀어야 자연스럽다.
관행대로 有를 ‘있다’로 옮기면, 우선 有의 목적물이나 대상을 객체화하지 못하고 주체화한 셈이다. 또한 그 뜻이 모호해진다. 앞에서 든 ‘있다’의 세 가지 뜻이 개별적으로 혹은 겹쳐서 나타나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有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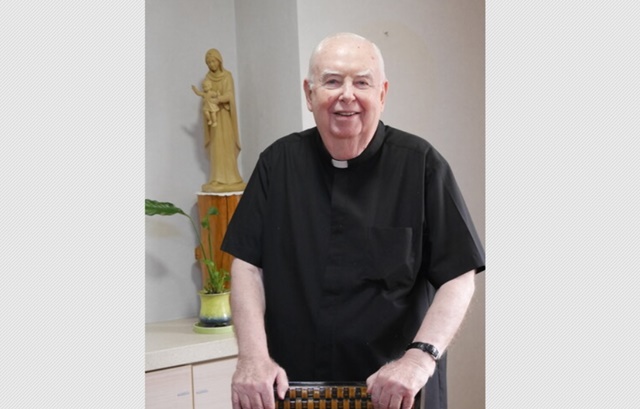
“0.5는 반올림해서 1이 되기에 유의미(有意味)한 숫자이다.” 有를 ‘있다’로 옮기면, 그 문장은 ‘‘0.5는 반올림해서 1이 되기에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로 된다. 의문이다. 0.5는 스스로 의미를 가지는가? 사물이 그 자체로 의미를 띄는가? 진달래꽃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가? 사람들이 진달래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의미를 두지 않으면, 진달래는 잡목에 지나지 않는다.
날이면 날마다 가슴을 치는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불교 경전의 정수인 ’반야심경‘도, 교회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가도 유의미하지 않다. 잡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공자님의 말씀도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내 귓전에 부딪히지도 못한다. 요컨대, ’유의미‘는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의미를 두다‘이다. ‘‘0.5는 반올림해서 1이 되기에 의미를 둘 만한 숫자이다.“
’유의미‘를 ’의미가 있다‘로 말하면, ’무의미‘(無意味)는 ’의미가 없다‘로 된다. ’의미가 없다‘도 앞에서 본 대로 ’의미가 있다‘와 같은 의문을 일으킨다. 어떤 일에 의미를 두다가도 시간이 흘러 사정이 변하면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하다. ’무의미‘는 어떤 의미의 가치가 점차로 줄어들면서 사라지니 ’의미를 없이 하다‘는 뜻이다. ’무의미‘는 그런 말을 하는 화자가 어떤 무엇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이는 중(中)을 ’무 과불급‘(無 過不及)으로 정의한다. 즉, 中은 과불급을 없이 함이다.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을 없이 함이다. 이렇게 하면, 中은 ’가운데‘라는 어떤 특정한 점이라기보다는 ’가운데‘를 향해 나아가는 진행의 뜻을 드러낸다. 中은 행위 개념이다. 상황의 진행이다. 평소 버릇처럼 中을 ’과불급이 없음‘으로 해석하면, 中은 상황의 완료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이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

주역 64괘 중 제15괘인 지산겸(地山謙)에서 ’상왈 지중유산 겸 군자이 부다익과 칭물평시‘(象曰 地中有山 謙 君子以 裒多益寡 稱物平施)’가 나온다. ”상에 가로되 땅 가운데(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군자가 이로써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데에 더해서, 물건을 저울질하여 베풂을 고르게 하니라“(김석진, <대산 주역 강해(상경), 214쪽).
나는 주역에 관한 이해가 초보 수준이다. 위 말씀의 전반부(지중유산 겸)는 하느님의 뜻이고, 후반부는 그 뜻을 세상 사람이 교훈으로 삼아 어떻게 실천할지를 보여준다. ‘地中有山 謙’은 ‘(하느님이) 땅 가운데 산을 둔 것이 겸이다.’로, 후반부 ’君子以 裒多益寡 稱物平施‘는 ’세상 사람은 (겸의 뜻을 살려) 많은 데서 취하여 적은 데에 더해 주고, 물건을 저울질하여 베풂을 고르게 해야 한다.‘로 각각 풀이된다. 요컨대, 有는 ‘있을 유’라기 보다 ‘둘 유’라고 읽으면 글자 有가 들어간 문장의 뜻이 새롭게 다가온다.

한편 <다음 한자사전>에서 有의 두 번째 큰 뜻으로 ‘또 유’가 제시됐다. 이는 有 ={月, 又}에서 又를 ‘또 우’로 해석한 까닭으로 보인다. 공자님의 자서전으로도 읽히는 대목인 ‘오십유오이 지우학’(吾十有五而 志于學; <논어; 위정제2, 4장>)은 문자대로는 ‘나는 열 살에 또 다섯 살이 되어서 학문을 향해 마음이 움직여 나아갔다.’이다. 有를 ‘둘 유’로 풀어도 뜻은 통한다. ‘나는 열 살에 다섯 살을 더 두어서 학문을 향해 마음이 움직여 나아갔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내게 有는 ‘둘 유’로 다가온다. ‘물유본말 사유종시 지소선후즉근도의’(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則近道矣
; <대학, 경1장 제3절>). ‘(하느님이) 物에는 근본과 지엽을 두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을 두었으니, (세상 사람이) 먼저 하고 나중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깝도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글과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사기꾼이나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말리해야 하지요.
전광훈을 통해 우리가 치루는 댓가가 혹독합니다.
한 마디의 말이나 글이라도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가르침을 주는 형광석 통신원의 파자명상!
주말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