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 入’, 이는 데칼코마니(décalcomanie)를 연상시키는 좌우 대칭인 두 글자이다. 또한 ‘入 人’도 좌우대칭이다. ‘入人 人入’(입인 인입), 어떤 뜻일까? 내 나름대로 풀어본다. ‘(내가) 남에게 들어가니, (내게) 남이 들어오는구나.’ 혹은 ‘남에게 안기니, 그 남이 (내게) 안기는구나.’
人은 누구든지 ‘사람 인’으로 읽는다. 맞다. 그렇게 알고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에 젖다 보면 익숙해진다. 익숙하면 낯설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이제 人을 주로 ‘남 인’으로 읽는다. 그런 지 이삼 년이 떠나갔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人의 두 번째 뜻으로 ‘다른 사람, 타인, 남’을 제시했다.

청년기에 만난 어느 선생님은 인권(人權)을 ‘너의 권리’, ‘남의 권리’라고 풀이하셨다. 人은 ‘남 인’이다. 또한 아권(我權; 내 권리)이라 하지 않고 ‘인권’이라고 부르는 점에 유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이자 세계적으로 양심수를 돕는 활동을 하는 국제앰네스티(International Amnesty; www.amnesty.org)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뤄지도록 실천하신 분이다.
광주광역시 봉선2동 성당 현관에 들어서면, 마주치는 편액(扁額)에 붓글씨로 써진 네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온다. ‘敬天愛人’(경천애인). 처음 접할 때는 뜻을 잘 몰랐기에 매우 낯설었다. 생뚱하게 다가왔다. 보통 사람은 그 글귀의 뜻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로 옮길 거다. 약 1명이라도 ‘애인을 하늘처럼 공경하라.’로 옮기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 즉 남이다. 남은 나를 둘러싼 이웃 사람이다. 넓게 보면, 나의 이웃은 내가 속한 대자연이다. 따라서 ‘애인’은 ‘사람을 사랑하라’에서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라’로, ‘이웃을 사랑하라’로 풀어진다. 요컨대, ‘경천애인’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응축한 글귀다. 바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제 성당에 걸린 편액의 ‘敬天愛人’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는 애인(愛人)의 人을 ‘남 인’으로 읽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보면, ‘事人如天’(사인여천)은 ‘하느님을 섬기듯이 남을 섬겨라’이다. 事는 人과 天에 걸린다. ‘人乃天’(인내천)은 ‘(내가 아닌) 남이 곧 하느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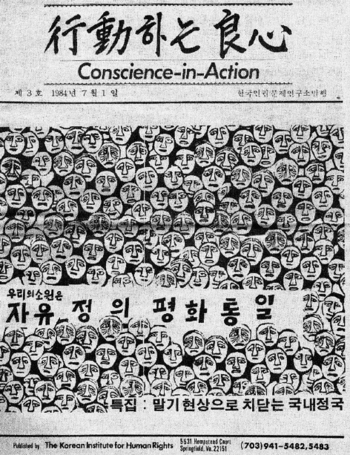
경상남도 함양(咸陽)에 바람 쐬러 갔다가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에서 값진 글귀인 ‘인백기천’(人百己千)을 얻었다. 통일신라 말기 최치원((崔致遠, 857년 ~ 908년 이후)은 당시 오늘날 함양(咸陽) 지역의 태수로 일하면서 소중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분이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조성했다는 함양 상림(上林)은 지금도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숲이다. 최 선생이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각오로 피력한 말이 바로 ‘인백기천’이다. ‘남이 백 번을 하면, 저는 천 번을 하겠습니다.’ 남보다 10배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인백기천’의 전거(典據)는 <중용(中庸), 제20장 제20절>의 끝부분이다. 人은 ‘남 인’이다.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인일능지 기백지 인십능지 기천지). ‘남이 한 번에 잘하면 나는 백 번을 하고, 남이 열 번에 잘한다면 나는 천 번을 하겠다.’ 남보다 100배를 더 해야 한다. 아마도 최치원 선생은 ‘己百之 己千之’에 착안하여 ‘人百己千’을 말씀하셨으리라. 남도 어떤 일을 잘하려면 적어도 일백 번을 할 테니, 나는 그 열 배인 일천 번을 해야 한다. 최치원 선생은 남(人)의 노력을 인정하고 자신을 다독였다고 봄 직하다.

<네이버 한자사전>을 보면, 人은 상형문자이다. 허리를 조금 굽힌 채 팔을 지긋이 내리고 선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소전(小篆)에서는 팔이 좀 더 늘어진 모습으로 바뀌어 지금의 人자가 되었다. 人의 오른쪽 획은 팔에 해당하는 셈이다.
글자 人에서 왼쪽 획은 양(陽)에, 오른쪽 획은 음(陰)에 대응한다. 임금은 대체로 남쪽을 바라본다. 임금 얼굴은 남쪽을 향한다. 이른바 남면(南面)을 한다. 임금 기준으로 왼쪽은 동쪽이요, 오른쪽은 서쪽이다. 즉 좌동우서(左東右西)이다. 이에 따라 좌양우음(左陽右陰)이다. 人의 글자는 음이 양을 받치고 지탱하는 모양이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은 음의 기운이 양기(陽氣)를 잘 받쳐주기에 똑바로 선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게는 ‘남’이다. 그 사람에게 ‘남’은 ‘나’이다. 그래서 남과 나는 서로 마주 보면서 상대방을 ‘남’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人은 ‘남 인’이다.
入은 ‘들 입’이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入은 토담집 따위에 들어감을 가리키는 지사문자로 풀이됐다. 밖에서 돈벌이 활동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몸과 맘은 긴장을 풀고 편히 쉬라고 한다. 양의 기운은 고개를 숙이고 음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래선지, 入의 오른쪽 획이 왼쪽 획보다 조금 길다.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보다 더 크다. 예전에 남편 혼자서 돈벌이하는 외벌이 풍토에서는 일터에서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아내의 애틋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맞벌이가 필수인 지금의 세상에서는 일터에서 집으로 들어온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쉼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양의 기운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만큼 음의 기운을 끌어올려 차분하고 부드러운 정서 상태로 들어가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좋겠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반년을 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나의 일탈 행동이 남의 밥그릇을 깨뜨리더니, 결국 내 밥그릇도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이다. 밥그릇의 연결을 회복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인입(人入), 즉 남이 내게 들어오도록 우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을 절제해야 하리. 말하자면, 수신(修身), 즉 각자 ‘내면 아이’(inner child)를 충분히 다독여야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남이다. 최치원 선생의 말씀처럼 천 번을 절제할 때, 백인(百人)이, 나를 제외한 온 사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후의 입인(入人)이 자연스럽겠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하늘을 공경하고 남을 사랑하라!
형광석 통신원의 파자명상을 읽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언어가 모호하면 행동도 명쾌하지가 못하지요. 누군가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다면 본인의 언어와 사고의 모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 人과 들 入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크게 깨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