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詩
시를 좋아해서 한창 시집을 즐겨 읽던 때가 있었다. 나이 오십에 들어서면서 시집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한동안은 시를 읽지 않고 지냈다. 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건 아니고 나이가 드니 글을 보면 글자가 흐릿하여 시 뿐만이 아니라 글로 된 것들을 자연 멀리하게 되어서다. 시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를 읽지 않고 그저 쉼표 같은 날을 보내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즈음 날이 선선해지고 계절 탓인지 문득문득 다시 시집을 꺼내 읽고 싶어 진다.
예전에 서점에 가면 시집 코너에서 주로 살았다. 이름을 나열하면 익히 알 만한 시인들과 새로이 등장하는 신선한 신예들의 시집을 펼쳐보며 시세계로 빠져들곤 했었다. 그때 행복하게도 시를 같이 나눌 친구가 있었다. 시를 읊어주면 곁에서 마음 기울여 들어주던 친구. 또한 친구가 시를 읊어주기도 하던... 지금 돌이켜봐도 내겐 그 어느 때 보다도 잊지 못 할 시절이었다.
1989년에는 한 시인의 죽음 소식을 접한다. 3류 영화관에서 새벽 시간 심야영화가 끝나고 관객이 다 돌아간 극장 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기형도 시인. 그때 나는 기형도 시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었지만 지인을 통해서 듣게된 그의 죽음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이었고 스산한 죽음이 나를 전율케했다. 어쩌다 황량한 죽음을 맞게된 건지 머리 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이 출간되었다.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삶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함을 넘어 한 인간 존재의 내면을 천착하고픈 마음에 한 권 뿐인 유고시집과 산문집을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그의 죽음과 함께 나에게로 온 기형도 시인은 그후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시인이 되었다.

기형도 시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서두가 길었나보다.
죽음에 당면했던 또 한 명의 시인 박정만. 이제부터 박정만 시인의 '종시(終詩);'란 시 한 편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박정만의 시집<그대에게 가는길> 맨 첫 페이지에 쓰여진 시가 바로 '終詩'다. 박정만은 필화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모진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종국에는 죽음을 맞게된 시인이다. 죽음 저편 서역 땅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토로한 시들이 시집 <그대에게 가는길>에 절절히 묻어있다.
終詩인데 어째서 시집 서두에, 그것도 맨 첫 페이지에 자리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잠시 접어두고 제목 아래 써있는 시를 읽어 내려갔다. 실은 읽어 내려갔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한 호흡에 읽히는 달랑 2행 뿐인 한 문장의 짧은 시였다.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이토록 짧은 시에 빠져서 나는 매료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시는 점점 커다란 울림이 되어 내 안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 인간은 생을 마감하고 사후에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시인은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저 무한한 우주 공간 속으로 사라져 간다는 우주론적 시상 때문에 이 시에 끌렸던 것일까. 순간 나는 무한 우주의 한 존재로 인식되는 나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태어나 살다 죽음을 맞는 생물학적인 모습이 아닌, 인간 존재는 어느 순간 저 우주로부터 와 어느 순간 저 우주 공간으로 사라진다는...
박정만 시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를 추모하기 위한 전기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앞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기억에 없지만 드라마 마지막 장면만은 이 시를 영상화 하였기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다가오는 절망적 죽음의 불안 속에서도 삶의 마지막을 향한 시를 써내려가지만 결국 죽음의 시간은 닥쳐오고 만다. 순간, 원고지 위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는 시인. 그때 펜을 담궜던 잉크병이 쓰러지고 잉크가 쏟다져 번지며 원고지가 점점 검게 물들어 간다. 서서히 원고지를 다 물들이고 원고지 밖까지 퍼져 화면 가득 채워지는데 그 검은 화면이 마치 무한 우주 공간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검은 공간에 시가 쓰여지고 나레이터의 비장한 음성이 낮게 울려퍼진다.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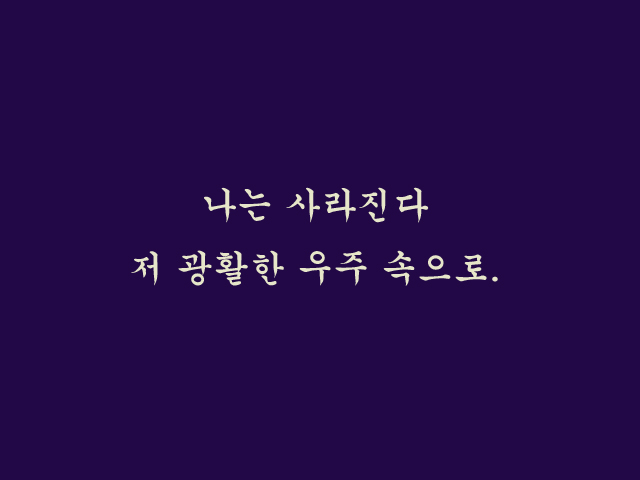
잠시 후 글은 위로 올라가 사라지고 화면은 한동안 무한 공간으로 검게 남아 있다. 시 마지막에 찍은 마침표처럼 무한 우주 공간의 한 점으로 사라져간 시인.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그곳.
'終詩'로 세상 저편, 저 우주 공간으로 사라져 간 두 시인을 되돌아보았다.
어이없게도 <그대에게 가는길>이 유고시집인 걸 이 글을 쓰며 새롭게 알게되었다. 시만 몰두해 읽다 보니 겉표지에 유고시집이라고 씌어진 것도 보이지 않았나보다. 그러고보니 유고시집을 통해 두 시인을 만나게 된 셈이다. 유고시집인 걸로 봐서 서두에 자리한 '終詩'는 시인의 뜻이 아닌 편집상의 배열일 수 있겠다고 의문을 풀어본다. 혹여 시인의 유언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편집: 이미진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