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란 김을 말한다. 해태라고 하기 전에는 해의(海衣)라고 했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김이 바위를 덮고 있어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바다 옷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 글 제목의 해태왕국 완도는 1937년 12월 16일 자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이런 해의(海衣)에 대한 최초기록은 1425년(세종 7) 경상도 지리지에 토산품에 해의(海衣)로 기록된 것이 최초이고, 1530년(중종 25)에 동국여지승람에 광양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태란 이름은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다. 김이란 이름은 광양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한데서 김이란 이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 양식의 기원을 보면 1623~1649년 사이 광양시 태인도 김영익(1616~1660)이란 사람이 떠다니는 나무토막에 김이 부착된 것을 보고 나무 섶을 갯벌에 박아서 김 양식을 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현종, 철종 때 조약도(지금의 완도군 약산도)의 어두리(魚頭里)에서 정지원이란 사람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설치해 놓은 대나무에 김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시작했는데, 이를 염송(簾篊)이라고 이름하고 김 양식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어민들은 대나무를 쪼개서 발로 쓴다고 해서 대적자를 써서 개발이라고도 했다.

위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그해에는 유난히도 김의 생산량이 많았던 것 같다. 당시는 완도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했느니 가히 김 생산의 왕국이라 표현했을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면 생산액이 무려 200만 원이라고 했으며, 송(松) 한속의 가격은 1원 7전이고, 죽(竹)은 1원이라고 가격까지 기록하였다. 이때는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가난했던 때다. ‘가난하다’는 말의 유래를 보면, 옛말인 ‘艱難하다의 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간난이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의 의미라고 한다.
1918년의 김 총생산량은 137t, 1942년에는 2725t으로 이때는 주로 일본에 수출하는 김으로 생산을 하였다. 한창 수출을 하던 1967년에는 김 생산량이 5,988속이었다. 1961년에는 김의 수출로 경제 사정이 아주 좋아서 완도에서는 개가 500환짜리 고액권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였다. 또한 방석집이라 불리던 술집에서 첫 손님으로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이 오면 아가씨들 왈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고 했다. 그럼 누구를 좋아했을까? 그것은 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이다.
이 말은 비록 옷이 바닷물에 저려있더라도 그 속에는 뭉칫돈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김이 생산되면 건조, 판매하는데 그 등급이 참 묘하다. 특송(特松), 송(松), 죽(竹), 매(楳), 동(桐), 추(秋), 풍(楓), 등(燈)으로 8등급으로 분류하여 검사하였다. 특별수송은 거의 없고 송부터 생산이 되었다. 묘하게도 등급의 명칭이 모두 나무와 연관이 있는 글자를 쓴 점이 참으로 특이하다.
이렇게 김을 생산하다 보니 1917년에 완도 해태 수산조합이 설립되었고, 1924년에는 조선총독부령 84호에 이거 해태 검사가 시작되었다. 김 생산으로 소득이 높아지자 1950년대에는 완도군의 인구가 16만에 가까웠다. 이 많은 인구의 약 90% 정도는 김 생산에 종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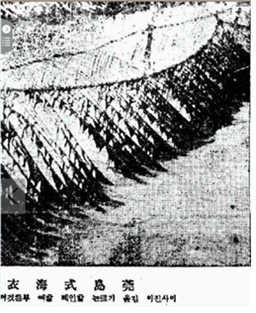
위의 사진은 1931년 2월 22일자 동아일보의 사진이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되면 제 밥값을 한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벽 3시면 일어나 김의 원초를 칼로 쪼아 발장에 붙여야 하고 건조장에 널어서 말리는데다 마를 시간이 되면 바빠졌기 때문이다.
다 마른 김을 마무리 해놓고 다음 날 쓸 김을 채취하러 가야하니, 점심은 물 때에 따라 다르지만 건조장 앞에서 고구마 몇 개와 파래김치로 대충 때우고 채취에 나서는데,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 오면 스스로 알아서 점심을 챙겨 먹고 건조장으로 갔다. 건조장에 가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발장을 가지런히 추려 놓고 부모님들이 김 채취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당시의 공무원들은 마을이장을 만나려고 출장을 나오면 누구네 건조장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건조장으로 찾아가서 새참을 같이 먹고 바쁘면 일도 거들어 주고 출장 업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까지, 겨우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결속(結束)이라고 하여 낮에 말려 놓은 김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듬고 묶어서 놓은 후에야 겨우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다음날 쓸 김을 뜯어는 왔지만 혹 파래가 섞여 있으면 파래를 골라내어야 한다. 파래가 섞여 있으면 값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전등불도 없는 호롱불 밑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자정에 가까워졌다. 잠은 겨우 대략 네다섯 시간 밖에 잘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제 말려 놓은 김을 가족 중 누군가 새벽에 판매를 하러 읍내로 가야한다. 판매를 하고 온 사람은 바로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곧장 건조장으로 가서 보고를 한다. 김 값을 잘 받는 날이면 온 가족이 모두 깔깔 거리고 한바탕 웃고는 더 힘을 받아 일을 잘 했다.
그렇게 완도에 부를 안겨주었던 김(해태), 그 김의 왕국이라 불리던 완도가 이제 전복양식으로 변경하면서 인근의 해남과 장흥에 밀려 있지만, 그래도 실제 수산 소득은 어느 군보다 높다. 완도민들은 완도 김이 임금 진상품이었던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옛날이긴 하지만......,
김 양식을 시작할 시기가 되면 가난 때문에 농어민들의 삶은 몹시 어려웠다. 농어촌에서 벼를 수확하기까지 식량이 모자라 정부 양곡을 가져다 먹고 가을에 벼를 수확하면 그때 갚는 때였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오직 김이 생산되어야 빚도 갚고 자식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김 생산이 끝남과 동시에 빌린 양곡 값을 갚아야 했기에 돈이 다 없어지는 어려운 시기이기도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공판에 물 떨어지면 돈도 같이 떨어진다고 했다. 공판이란 김을 뜰 때 까라 놓고 사용하던 판을 말한다.
그때 정부는 외화가 없어서 무척 어려운 때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이 수출이 되어 외화를 벌어 오는 것을 알고, 완도의 조합장들이 면담을 하려고 사전 예약하지 않아도 완도에서 조합장이 왔다고만 하면 만나주었다고 한다. 조합장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단 한 가지 김 생산을 위한 예산이었다. 대통령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면 상공부장관을 불러 조합장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라고 할 정도였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 돈은 소위 전도금(前渡金)이란 이름으로 어민들에게 대출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김 양식이 시작되고, 김을 수확을 하면 그 빚을 갚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이제 돈이 남아 돈다고 한다. 어촌에 살고 있는 양식 어민들은 넉넉한 여유 돈이 두고 살아가고 있다.
1948년 6월 20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태 수출액이 10억원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해의(海衣)에 대해 쓴 내용을 보면 남조선 수산계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海衣는 일본무역의 총애를 받아 여수항에 집하된 수출 해의 510만속 중 3백만 속은 두 차례에 걸쳐 수출되었고, 210만속은 잔고 되어 수산협회에서는 중앙청에 수출허가를 교섭 중이든 바, 지난 3일부로 허가 되어 운수부 소속선 리차드W턱스호에 잔고 210만속을 적재하여 지난 9일 출항하였는데, 가격은 전반이 1속당 176원60전과 금번의 속당(束當) 250원으로 1947년도 해의(海衣)수출 총액은 10억5천4백8십만 원의 거액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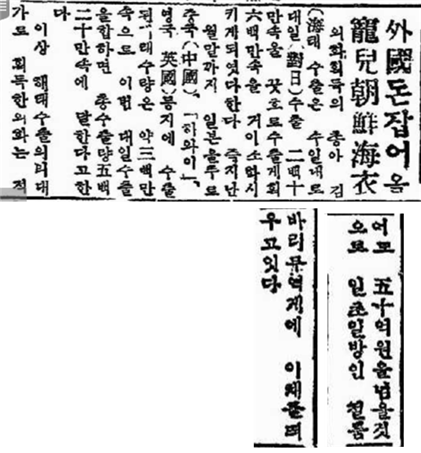
이렇게 많은 수출을 했으니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을 것이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