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사 형식의 철학적 탐구
서설, ‘조선朝鮮’의 유래
대체 조선은 어디서 비롯되었나...
여기, 조선은 그 헤겔적 의미에서의 하나의 ‘대자적’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 말글을 국수적인 의미의 ‘한글’보다는 보다 중성적으로 ‘한국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오롯이 담은 학문을 전래로 ‘조선학’이라 부르는 것은 상대를 의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조선학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도 아니요, 부르주아적 민족주의도 아닌 ‘대상적’ 또는 ‘저항적’ 의미를 지닌 조선학을 가리킵니다. 조선학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경제적, 문화적 침략에 따른 대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선학은 세계 문화의 일부로서 ‘조선적인 것’이라는 소수성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문화를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의 ‘자기 의식self-conscious’으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자 대자적 인식의 소산으로 자신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외부와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어느 민족이든 그러한 것처럼, ‘조선’이라는 개념 또한 외부에 대한 대타적 인식의 소산으로서의 민족 감정, 영토 의식, 언어 주권 등 에스니ethnies한 민족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 독일을 가리켜 ‘게르만German’이라 하고, 영국을 ‘브리튼Briton’이라 부르며, 프랑스를 ‘골Gaul족’의 후예라 칭하는 것처럼, 꼭 그처럼 중국인들은 자신을 한고조漢高祖 유방이 세운 한漢이 양자강의 큰 지류인 한수漢水에서 유래되었다 하여 ‘한인漢人’이라 자칭하듯이, 마찬가지로 천황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감정으로서의 충성을 지닌 일본인이 스스로 ‘니혼진日本人’이라 하듯,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개 역사적인 민족의 개념으로 ‘조선朝鮮’으로 불러왔습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이든 하나의 신화이자 하나의 내력으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이라는 역사와 신화도 마찬가집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의 공식명칭인 대한민국을 ‘Korea'라고 하는데, 본래는 조선이라 했던 것으로 조선朝鮮은 대한민국의 국조라 일컬어지는 단군이 처음 나라를 개창한 때의 서울로 우리말 ‘아사달’을 한자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서울’과 ‘아사달’은 이음동의어입니다.
오늘 아침이라는 고대어 ‘아사’의 의미는 지금도 남아서 조선의 후예인 고구려-백제의 땅 홍성의 ‘조양문朝陽門’에 그 자취가 남아 있고, 일본의 유력한 저널 조일신문朝日新聞을 ‘아사히 신문’이라 읽는데, 이것 또한 고조선의 후예가 고구려,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남긴 엄연한 흔적이니, 이는 그리스 신화 상의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matr’가 라틴어 ‘mater’를 거쳐 오늘 영어 ‘mother’와 ‘metro’가 된 것처럼 하나의 기원으로서의 민족의 고유한 내력을 지닌 언어의 힘과 영향은 마치 어깨에 불주사를 맞은 자국처럼 흔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먼 대체 ‘코리아’는 또한 어디서 나온 말인지...잘 알다시피, ‘Korea’는 고려 왕조 당시 외국 상인들에 의해 세계에 알려진 이래 ‘고려’의 영어식 표현으로, ‘Corea’가 바뀐 형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칭입니다. 그렇다먼 고려는 또 어디서 나왔나. 고려高麗는 고구려高句麗의 후손이라는 계승의식에서 나온 준말입니다. 그렇다먼 다시 고구려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어원학philology도 일종의 퍼즐 맞추기라먼 잃어버린 어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사회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상상-조합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코리아가 고려에서, 고려가 다시 고구려에서 발원되었다고 하니, 고구려부터 시작해 보것습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동명성왕東明聖王으로 불리는 고주몽高朱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씨高氏에서 ‘고高’가 나왔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는 건 ‘구려句麗’입니다. 대체 ‘구려’는 또 뭘까.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등 고문헌 상에 드러난 여러 자료를 참고해 이야기해 보것습니다.
고조선의 후예 해모수가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북부여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해부루인데, 그가 오래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 지내기 위해 큰 연못가를 지나는데, 큰 바위 근처에서 빛이 나 들춰보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해부루는 이 어린애를 거두어 아들을 삼았는데, 금덩이 같이 빛난다 또는 금빛 개구리 모양 같다 하여 ‘금와金蛙’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와는 우리말의 ‘금개구리’를 한자로 취한 것입니다. 이 북부여의 금와왕이 졸본으로 옮겨와 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입니다.
이 여자가 대단한 미인이었는지 마치 저 그리스의 바람둥이 신 제우스처럼 해모수가 몰래 유인하여 정have an affairs을 통해 놓고는 돌아오지 않아 부모는 중매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금와는 이 여자를 이상히 여겨 방 속에 가두어 두었는데 햇빛이 따라다니면서 비쳤다 합니다.
이후 곧 태기가 있어 알 하나를 낳으니 매우 컸습니다. 이 알을 짐승들에게 던져주니 먹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쪼개려 했으나 쪼갤 수 없어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는데, 얼마 후에 골격이 크고 외양이 특이한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건 그대로 고대의 영웅신화를 연상케 하는 대목 아닌가. 또 알에서 신성한 시조가 태어났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목격되는 태양신화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낳은 아들이 고주몽인데, 주몽이라는 ‘이름personal name’은 당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일컫는 말에서 취하였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성씨family name’는 해씨도 아니고 유씨도 아니고 왜 고씨일까. 고기古記를 ‘다시’ 보니, 금와왕이 유씨 부인을 몰래 유인하여 정을 통한 곳이 웅신산熊神山입니다.
웅신산은 우리말로 곰신을 숭배하는 산 ‘고마뫼’ 곧 개마산으로, 백두산을 달리 이르는 말이니, 웅신산은 곧 백두산입니다. 즉, ‘고’는 고마뫼, 태어난 곳에서 취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성씨를 일컬을 때 태어난 곳, 관향貫鄕을 따르니 이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구려’입니다. 의문은 뜻밖에 박지원의 글(<열하일기>, ‘피서록’, 돌베개)에서 풀렸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은 <한서漢書> ‘지리지’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선조는 금와金蛙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와蛙를 ‘개구리皆句麗’ 또는 ‘왕마구리王摩句麗’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질박하고 솔직하여 임금의 이름을 곧바로 국호로 삼았고, 그래서 성씨인 고高를 앞에 붙여서 고구려하고 한 것입니다.”
라며, 당시 박지원의 제자이자 규장각의 각신閣臣으로 있던 청장관靑莊館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Korea의 어원이 된 ‘고구려’는 관향, 백두산과 고주몽의 선조, 금와왕에게서 취한 것입니다. 금와왕도 단군의 자손이니, 우리는 고유의 내력을 지닌 고조선의 후예이고, 백두의 혼을 지닌 역사적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론 경계해야 할 것은 한민족이 특별히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천손天孫의 민족이라거나 신인神人인 단군의 자손이라는 과도한 국수주의적 태도입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했던 자들이 ‘민족’이라는 외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 희석시키려했던 ‘개 같은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저 이광수, 서정주, 김동인 류의 가짜 민족주의 문사들에게서 배운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민족부르주아지들을 부추기어 인류를 소돔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럴 때마다 그가 외친 것은 늘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라는 수사였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거니와, 저 공자孔子에게서 비롯된 중국적 국수주의, 이른바 ‘중화주의’도 마찬가지로 주변국에 대한 과도한 우월감에 바탕하고 있는 지나친 중화 의식은 외부와 동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거니와, 그리고 동양 침략에 열광했던 일본인들처럼 국수주의는 자국민을 기만적 동일화의 맹목에 빠뜨리고 ‘배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등 우리가 이런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인류를 ‘어둠의 심연’에 빠뜨린 전체주의적 독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화는 비역사적이라고 하먼서 단군을 한국 민족정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인의 의식을 백안시하는 일부 교조적 계급 사관을 지닌 자들의 극좌적인 의견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먼 신화는 세계 공통의 고대 국가의 건국 서사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건국신화로서 신화의 주인공, 가령 제우스는 헤겔(<역사철학강의>)의 말대로 국가라는 공동체 작품을 낳은 정치적인 신이었던 것입니다. 신화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갈릴레이 이전의 천동설도 지금에야 신화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의 과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엄연한 과학지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사의 한 층layer을 형성하고 있는 천동설을 비근대적인 신화적 자연관이라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꼭 그처럼 그 궁극에 있어서는 과학도 하나의 역사이고,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재real도-이 실재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상관없이-하나의 사회적 합의로서 그 ‘실재성realite’이 옹호되지 않고서는 실재 현실reality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도 그렇고 신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화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자연이나 사회적인 여러 형태 그 자체가 이미 민족의 공상과 상상에 의하여 의식, 무의식 속에 하나의 예술적인 방식으로 가공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신화가 오랜 동안 유지 전승, 현재까지도 한 민족의 의식, 무의식 속에 예술적 생명을 발하고 있다는 것은 신화의 불사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과학적 유물론의 창시자 마르크스조차 이런 신화로서의 예술의 불사성이 지닌 의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호메로스 서사시의 사회적인 발생 조건을 깊고 상세하게 분석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그리스의 예술이나 서사시가 사회적 발전의 일정한 형태와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은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어떤 점에서는 규범으로서 또는 도달할 수 없는 모범으로서 통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 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서설’, 중원문화, 2017.
어느 문화도 그 혼자서는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가령, 마르크스가 말하는 고대 그리스 문화가 유럽 문명의 원형이라 하지만 이 또한 이집트와 크레타 등 지중해 문명과의 활발한 교류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언중들에게 구전되어온 말의 뿌리語源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이형, 변형을 지니고는 있으나 그 깊은 근원에서 볼 때, 현실에서 발원한 원형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사상은 현실에 바탕하지 않고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Korea’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저 그리스 신화처럼 역사적 시원으로서 뿌리를 지닌 한국인의 보편적 꿈과 욕망, 의지를 드러낸 정신적 공동체의 원형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사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언어예술, 조형예술, 학문, 철학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민족에 따라 표현양식과 방향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용에야말로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합리성의 차이라는 가장 큰 차이이다.” - 헤겔, <역사철학강의>, 머리글, 동서문화사.
이런 차이로 인해 세계사에 등장하는 각 민족은 각자 그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이라는 개념은 고려 후기 몽고의 침략과 이에 대응한 일연 <삼국유사>의 ‘고조선’ 신화와 사뇌가라는 10구체 향가, 이규보의 민족서사시 <동명왕편>, 임란과 병란 이후 조선 후기 현실학파인 실학에서 ‘조선지풍朝鮮之風’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암의 <열하일기>와 일제 강점기, 특히 3.1 혁명 이후 ‘조선학 열풍’을 상징하는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등은 민족의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타자와 만나는 순간마다 항상 나타나는‘조선’은 하나의 차이이자 동일성으로 민족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 구심체이고 생명체이며 정신적 실체로 기능하였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이고 구심적인 역할을 지닌 서사시는 민족 공동체의 역사에서 생명의 노래이자 영혼의 이야기로 출현하였던 것이고, 이들은 모두 민족의 정신이 작품으로 외화되어 나타난 것이니, ‘조선’은 이렇게 민족의 고난과 함께 동일성의 요구에서 비롯된 대자적 자기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또는 국적: nationality)이라는 말은 주관적 개념이어서 과학적 의미에서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민족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개념입니다. 또한 글로벌화한 지구촌 시대를 맞아 민족의 개념은 이제 폐기된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선의, 아니 한국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아니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나 돌이켜보먼 우리 자신을 ‘대자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거니와, 오히려 또한 그러함으로 우리 또한 그 세계사의 한 부분으로 새로운 역사 창조의 계기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창조적 외화의 길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In this regard,
이와 관련하여 볼 때에 있어서 다음 대목은 세기의 지성 루카치가 자기도 모르게 ‘이처럼 아름답고 올바른 규정’이라고 다소 감상적이고 주관적인 평을 놓았던 것처럼, 이것은 나와 그들, 민족과 세계와의 진실한 관계에 대한 참으로 아름답고 올바른 규정일 뿐 아니라 증말이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인식입니다.
“무한히 많은 유기체, 즉 개체들이라는 점에서는 수다성(數多性, Vielheit)이며 유기적으로 조직된, 즉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통일되어 있는 단일한 전체라는 점에서는 통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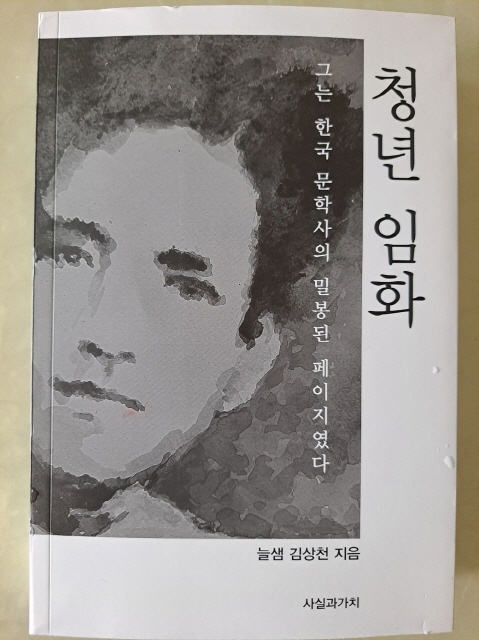
중요한 것은 개체와 전체는 서로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르지도 않고 둘이 아니라는 불일불이不一不二한 헤겔의‘유기적인’ 변증법적 사고가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니요, 전래의 조선에도 원효의 오도송悟道頌을 비롯 연암 박지원의 천재적인 산문 등에 이미 세계와 통하는 ‘조선 고유의’ 사유와 시도 아니요 소설도 아닌 한국형 서사체라 할 고유의 서사 형식이 간단없이 흘러오고 있으며, ‘이식문학론’ 등 임화의 서사적 변증법과 프로시, 김수영의 “나는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다”는 민중적 변증법과 산문시, 또한 이에 못지않은 독자적이고 유기적이먼서도 종합적인 대승적 사유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글을 이끌어 나가는 종지宗旨가 되것거니와, 아무튼 하나의 기호 막대로써 ‘조선’이라는 대자적 자기 의식이 그 어떤 이념적 무늬와 얼개를 지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투사되어 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장장하게 풀어보도록 하것습니다.
그나저나 왜 하필 형식인지...형식이야말로 지식의 참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글 가운데 하면(->하먼), 겠(->것), 못(-> 모), 어떻게(->어티케), 정말이지(->증말이지)로 표현하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