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안내면 이종수
오래된 그리움의 끝은 어디일까. 세월의 나이테를 쌓아가는 흔적은 깊어지는 주름으로 새겨지지만 어린 시절 영혼을 사로잡았던 마음의 상처도 내내 마음자리에 각인되어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헤어지던 여섯 살의 기억을 갖고 계시다는 이 선생님. 내내 그날의 기억을 붙잡고 77세까지 오셨다. 1945년 해방둥이지만 아직 마음은 여섯 살에 멈춰 버린 것 같다고 하시며 언제나 진짜 어른이 될까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지난 삶이 후회와 아쉬움, 그리움으로 켜켜이 쌓였다고 하시며 인생이 때론 헛헛하다고 씁쓸한 마음도 숨기지 않으셨다. 하늘을 물끄러미 올라다보시면서 한마디 읊조리셨다. ‘내 식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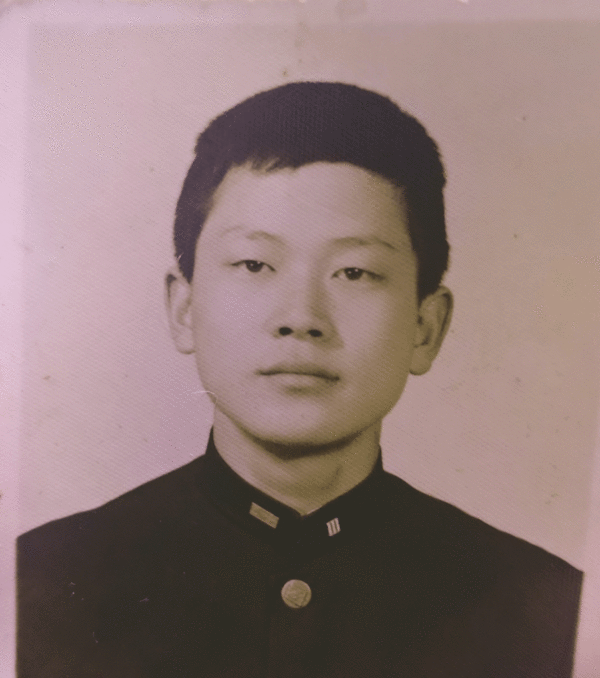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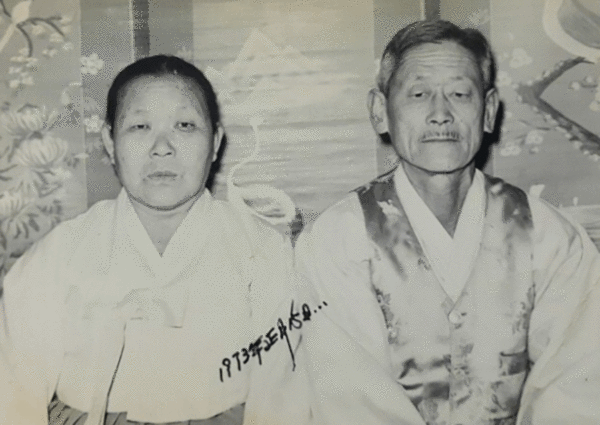
■ 월명광산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의 사고사로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가 되다
안내면 인포리가 고향인 내가 태어나서 두 돌 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명치리 월명 광산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여섯 살 때 재가하셨다. 까마득하지만 여섯 살 때 재가해서 대구로 가시는 엄마를 졸졸 따라갔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엄마 손잡고 옥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밤중에 대구역에 도착했다.
나이로 보면 여섯 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나이인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 골깊은 세월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25살의 어머니는 재가를 하셨는데 새 아버지는 늙수그레한 분이었다. 아버지 집에 있던 고등학생 형님은 내가 처음 만난 두려운 대상이었다. 고등학생 형님은 나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형님이 눌러 쓴 학생모 아래 번뜩이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는 날이면 나는 주눅이 들어서 땅만 보고 다녔다.
내 작은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때였다. 그래서 나는 그 때의 ‘작고 겁 많은 아이’를 평생 가슴에 품고 다녔다. 성인이 되어서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자아는 평생 나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했는데 어린 나의 행동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을지 그때는 짐작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구 새아버지는 이북 사람으로 서문시장에서 잡화장사를 했다. 엄마랑 나는 가게 딸린 방에서 살며 밥상머리에서 눈치만 보았고 눈칫밥 먹으면서 여덟 살이 되었다.
어느 날 대구 집 대문을 열고 “종수야 종수야”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격앙된 음성으로 “종수야 집에 가자”말했다. 나는 엄마 치맛단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다.
새 아버지 집에서 설움이 복받쳐서 어머니 손을 놓고 말았다. 나는 그 길로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옥천 집으로 올라왔다. 할아버지도 내가 성이 다른 최씨 밑에서 눈칫밥 먹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 내려오신 것이다.
옥천으로 돌아올 때는 1954년 정도였는데 옥천으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선창’이 어디선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도 그 노래를 부르시고 나도 그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할머니가 귓속말로 “종수야 할아버지 우시니까 노래 하지 마라”고 하셨다. 지금도 나는 ‘선창’을 즐겨 부른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을려고 왔던가’ 구슬픈 노래 가락에 할아버지도 근심을 묻으셨나 보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들 생각에 아마 눈물을 훔치셨으리라 짐작한다. 노래든 물건이든 사연이 있으면 마음 한편에 각인되고 애착이 생기기 마련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아야만 잠드는 아이가 되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안내에서 농사를 크게 지었다. 구읍 삼양리에서는 집을 세놓았다. 6.25사변 뒤라 삼양리 집 창고를 개조해서 함석집을 만들고 세를 주었다.
어린 시절은 유복하게 보냈지만 나는 울보였다. 할아버지 품에서 어리광쟁이로 성장하느라 뜻대로 안 되면 울고 내적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몸만 자라고 있었다. 13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우주가 산산조각나는 충격을 받고 말았다. 옥천중학교 다닐 때도 나는 울보 소리 들으면서 사춘기를 보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와의 생이별, 새아버지 집에서의 설움들이 유년의 나를 정서적으로 옥죄었다. 청주농고를 졸업하고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 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라 6개월간 방위 근무를 하면서 군 복무를 마쳤다.
■ 사회 초년생, 첫 이름표는 ‘면서기’
제대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시험이라는 첫 번째 관문에 문을 두드린 것은 학교 교사 시험이었다. 한시적이었지만 사범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시험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있어서 도전했지만 탈락하고 면서기 시험을 보았다. 학교 3년 선배가 “종수야 너 공무원 시험 볼래?” 라고 지나가듯이 건넨 말이 인생을 결정하고 말았다.
제대 후에 단양에 잠시 머물렀는데 단양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단양에서 면서기로 20년간 재직했다. 영춘면에서 하숙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1968년에 시험보고 농업직이라 영어, 수학 과목이 없었다. 국사, 농업, 국어, 역사 등의 과목으로 기억한다. 1969년 3월15일자 발령받고 영춘면에서 첫 근무를 시작 했다. 그 시절에는 공무원이 업무는 많고 봉급이 작아 박봉하면 공무원이라고 바로 말할 만큼 면서기할 때는 고생이 많았다. 지금 공무원의 위상을 보면 격세지감을 톡톡히 느낀다.
나는 화전민들 정리 담당 업무를 맡았다. 화전민들은 산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조선시대는 변란을 피해서 산으로 숨어든 사람들이었고 사변 이후에는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6.25 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속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천주교 박해로 산으로 숨어든 신자들도 많았다. 결국 역사 이면으로 숨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화전민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주비를 조금이라도 손에 쥐어주었지만 그 돈으로 사람행세를 할 수는 없는 돈이었다. 사람마다 각각 처신의 방법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청주 가서 땅을 사고 후에 그 땅이 개발이 돼서 돈을 벌어 부자소리 듣기도 했다. 터를 일구고 살던 사람들을 내쫓는 일처럼 못할 짓도 없다. 서울에서 철거민들 내쫓듯이 우리도 화전민을 내몰았는데 낮에 화전민 철거 업무를 보고 저녁이면 대폿집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마음을 풀곤 했다. 우리끼리 못할 짓 한다고 위로하면서 막걸리 한잔씩 들이켰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영춘면에 근무할 때 나는 아내와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 키 크고 늘씬한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후광이 비춰서 눈이 부셨다. 아내가 들고 온 민원은 내 담당이 아니었지만 나는 이미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아내가 민원을 해결하고 나가자마자 따라 나갔다. 아내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용기를 냈다. 아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러마 허락을 해서 나는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아내를 뒤에 태웠다. 외롭게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주고 결혼하고 가족을 만드는 그 시간들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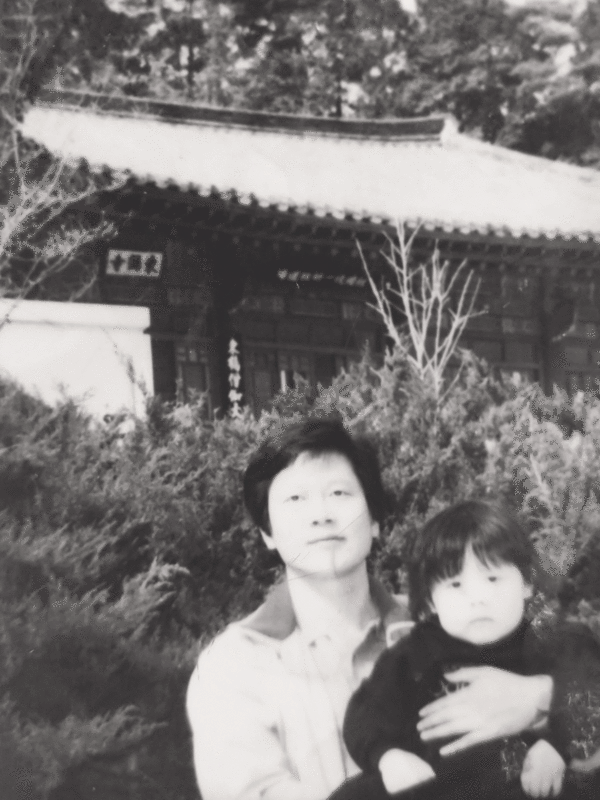
■ 다시 돌아온 고향은 쓸쓸하지만 평화롭다-두 보의 한시 ‘강촌’처럼
20년간 면서기로 일하다 퇴직하고 다시 고향마을 옥천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땅에 다시 집을 짓고 텃밭을 키우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퇴직 후에는 일손을 놓기 아까운 나이라 월전리에서 포도농사도 지어보고 안내에서 한우 농장을 몇 년 해보았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내 손맛이 녀석들에게 환영을 못 받아서 별 재미를 못보고 3년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아내도 일을 벌이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나는 공무원이 천직인 모양이다.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나가 큰 뜻을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이겠지.
여섯 살에 만들어진 ‘겁 많은 작은아이’가 아직 내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꼼짝을 하지 않는다. 사내대장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격동기에 급물살도 피해왔고 남한테 신세 질 일 없이 고향마을에서 노년의 시간을 한가로이 보내고 있다. 4남매가 세상에 나가 큰 뜻을 펼치고 있어 큰 위로가 된다.
나도 어느 순간에 무명인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겠지만 이 큰 우주에 작은 점으로 살아간 70년이 무심한 듯 지나왔다. 간간이 할아버지 꿈을 꾸는 걸보니 나는 아직도 할아버지 품안의 작은 사내 아이다.
이렇게 초야에 묻혀 조금은 쓸쓸한 노년이지만 두보의 시 ‘강촌’의 한 구절처럼 늙은 아내는 종이에 장기판을 만들거늘(老妻畵紙爲碁局) 어린 아들은 바늘 구부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들도다(稚子敲針作釣鉤, 한가하고 자적한 나날들이다. 마음 여린 남편을 만난 아내, 배포가 크지 못한 아버지를 만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한가하고 자적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내어 준 마음과 곁이다. 조금은 쓸쓸하지만 ‘인생이 그런거야’ 라고 껴안을 수 있는 품을 가졌다. 큰 아들이 주말에 휴가로 시골집에 온단다. 장기판을 꺼내 먼지라도 닦아둬야 하려나!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 글은 옥천닷컴(http://www.okcheoni.com/)과 제휴한 기사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okcheoni.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9
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옥천신문 기사더보기
- [은빛자서전 (119)] 꽉 채운 지난 세월이 낳은 근심 없는 하루
- [은빛자서전(118)] 이제 익숙한 수식어 ‘최고령’
- [은빛자서전 (117)] 막지리를 떠난 ‘이서방네 막내’
- [은빛자서전 (116)] 은퇴후 이력서, 전업주부 20년
- [은빛자서전 (115)] 89년의 항해, 만선이 된 배 한 척 김연옥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