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섭리를 거스르는 보청기
나더러 ‘지공거사’란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하릴없이 동네방네 싸돌아다니는 늙은이’라고 빈정대는 말임을 안다. 그뿐이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때문인지 아무한테나 기생충이란다. 아무튼 얹혀사는 기생충이요, 버러지다. 그냥 버러지가 아니다. 빌붙어 알랑질하는 버러지다. 피곤한 젊은이들 자리나 빼앗고, 죽치고 앉아서 세금이나 축내는 틀딱충 - 틀니나 딱딱거리며 무례한 짓을 일삼는 기생충 – 이다. 말 그대로라면, 알겨먹고 발라먹고 등쳐먹는 좀비와 다를 바 없다. 우라질, 이 땅의 늙은이는 꼼짝없이 흡혈귀가 되고 만다!
이름하여 ‘거사(居士)’다. 사전을 들추니,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숨은 선비’ 칭호를 듣게 된 지 꼬박 5년이 지났다. ‘선비’는 곧,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세속적 이익보다 대의와 의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정신”을 가진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언감생심, 나 같은 한낱 필부가 감히 쳐다볼 수나 있을까?
따순밥 먹고 그런 뻘소리하는 자는 정녕코 총한 놈이 아니다. 아무렴, 날 두고 ‘선비’라니 말이다. 얻다 대고 망발인가? 같잖은 말일랑 당최 하지를 마시라.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까지 오염된 오늘, 어딜 가서 ‘선비’를 찾는다고…. 이름도 유골도 온데간데없이, 구천에 호곡하는 영현(英顯)이시여, 이 땅에 선비는 씨가 말랐소이다. 부디 굽어살피시옵소서.

예로부터 나라 상감님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고?
눈 씻고 봐도 늙은이가 없을 때나 쓰던 말이다. 늙은이 천지인 요즘, 그런 퀴퀴한 말을 끄집어내는 자가 곧 고리탑탑한 늙은이렷다. 이미 고려장당한 헛말을 되새기지 마시라. 솔직히 누가 또 악다구니질 일삼는 늙은이로 보지 않을까 꺼려진다. 21세기 대한민국 짓거리가 참으로 혐오스럽다. 하지만, 늙은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혐기(嫌忌)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고도 한 입으로 G7을 들먹이고, 글로벌 운운하며, 혁신 선두 국가니, 중추 국가니 하면서 지지리 궁상 다 떨고 있다. 태생이 잘나빠진 저 값싼 주둥이들을 어찌할 순 없을까? 건뜻하면 신주 밑구멍까지 들먹이던 자들이, 이젠 신줏단지째 개밥통으로 던져버릴 요량이다.
따지고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오만 가지 말이 난무한다.
딴에는 뭐라도 되는 양 추어준답시고 ‘뉴 실버(New Silver)’니 ‘뉴 그레이(New Gray)’니 하더니, 이제는 애플족(Active, Pride, Peace, Luxury, Economy), 오팔족(Old People with Active Life), 욜드족(YOLD : Young Old)을 들먹인다. 대체 말뜻을 모르니 멀뚱거릴 수밖에. ‘나’는 그저 가만있는데, ‘나’를 두고 왜 그리 내지르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붕 뜨다가 시궁창에 곤두박이고 만다. 하나같이 서양 말투성이다. 돈깨나 있다는 노인을 뜻한다니, 겉발림으로 하는 말이 분명하다. 나이 든 늙은이라면, 눈 감고 따라가는 법이 없으렷다! 얍삽하고 엉큼한 장사꾼의 속내를 모르랴. 사대(事大)가 낳은 서양 말일랑 당신들만의 전용어로 꼼쳐 두시라, 제발.
그래서 하는 말이다.
늙은이, 당신은 이목구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타령하지 마시라. 군내 진동하는 세태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는 조물주의 섭리로 받아들이시라.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보청기가 아니다. 귀마개다. 구질구질하게 곰팡내 나는 말까지 새겨들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향내 풍기는 말만 듣기에도 버겁지 않은가.
향수니 방향 소취제가 다 소용없음을 익히 아는 늙은 나이다.
하지만,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고 했다. 가만있다고 소갈머리까지 없으랴. 나이 하면 그만이다. 공연히 연세니 춘추니, 연치니 귀경이니 하면서 달라질 것 없는 말농간에 열불나고 천불 나고,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그냥 두면 늙은인데, 옹(翁)이네 영감이네, 노인장이네 어르신입네 하더니 꼰대, 늙다리, 영감탱이로 짓깔고 뭉개 버린다. 위리안치가 따로 없다. 하다 하다 이제는 낫살이나 처먹은 주책망나니로 치부하고, 너무도 쉬이 요양원 골방으로 유배시킨다.
한갓 짐짝에 불과한 늙은이다.
그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찰거머리요, 잉여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들 몰아세운다. 과문한 나도 그런 투의 아가리질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이골이 난다. 아서라, 말아라, 나서지 마라. 숨이 막힌다. 늙은 영감 덜미 좀 그만 잡으라. 볼장 다 본 늙다리가 아니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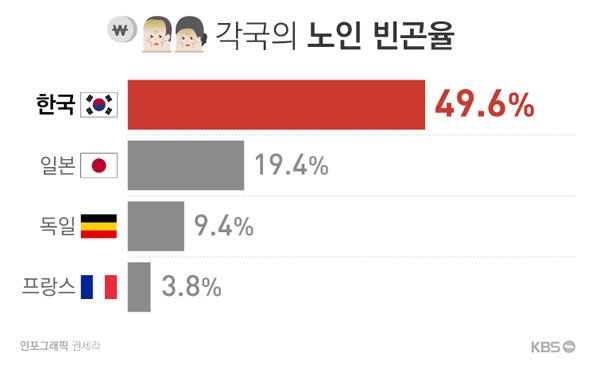
술망나니한테 주정뱅이라고 하면 싫어한다.
늙은이도 늙은이란 말을 들으면 흰자위를 치뜨며 노려보기 십상이다. 곧 죽어도 노땅이 아니라고 우기고 본다. 하물며 노틀, 늙다리, 늙은데기를 좋아할 리가 없다. 이는 분명히 명징한 자위 행위다. 반사적 본능일 뿐, 뒷손질 받을 일이 아니다. 늙은이는 노폐물이 아니다. 결코 한물간 퇴물이 아니다.
늙음은….
낡음이 아니다.
곪은 것이 아니다.
곯은 것이 아니다.
늙은이는….
생지가 아니라, 묵은지다.
썩은 것이 아니라, 곰삭은 것이다.
생판내기가 아니라, 노련한 익달꾼이다.


그래도 그렇지,
개입에서 개말 나온다지만
이런 개지랄이 또 있으랴?
늙은이는 사람이 아니란다!
‘노인(N0 人)’이라고 씨부렁댄다.
여북하면 그랬을까 하고 고개를
젓다가도 달리 할 말이 없다.
만만한 놈이라고 성도 없을까?
곯아도 젓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는 말은 묻어 두마.
늙은이라고 한년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아.
벙찐 늙은이 푸념 한 번 해도 괜찮겠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껄였다.
어렸을 때 따라 하던 일상 용어다.
하도 같잖은 세상이라
그냥 혼자 뇌까리는 넋두리일 뿐,
누구 들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제발 잘망스럽고
던적스런 자들도 마음에 두진 마시라.
옘병, 땜병, 아메다마 씹병 걸려 뒈질 놈들 같으니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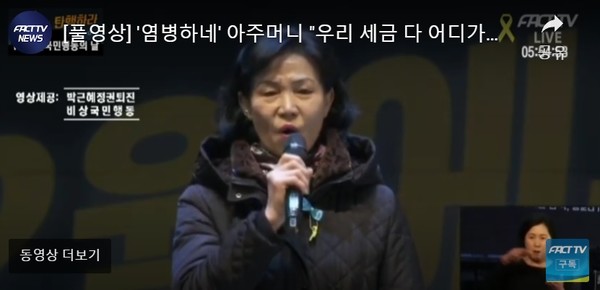
◉보태는 말◉
‘옘병’은 염병(染病)을 이르는 지방말이다. 이는 곧 전염병을 말하는데, ‘장티푸스’를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염병에 땀을 못 낼 놈’이란 속담이 있다. 이는 ‘염병을 앓으면서도 땀도 못 내고 죽을 놈’이라는 뜻으로, 저주를 내리는 욕말이다. 그러니까 ‘땜병’은 땀이 나지 않는 ‘땀병’을 이르는 지방말이다.
‘아메다마(あめだま•飴玉)’는 눈깔사탕을 이르는 일본말이다. 둥글고 단단하게 만든 사탕이다. 어렸을 때 유난히 희고 단단한 알사탕이 있었다. ‘십리사탕’이라고 불렀다. 아주 딴딴해서 깨물어 먹을 수 없고 빨아먹어야 하는데, 십 리를 갈 때까지 녹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네댓 살이었을 거다.
어느 날 밤, 할머니랑 건넛마을 마실 갔다 오다가 집으로 가는 길, 도랑을 건넜다. 분명히 오두방정을 떨면서 갖은 잡짓 다 했을 터. 고무신이 벗겨지는 바람에 그만 입에 물고 있던 십리사탕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캄캄한 밤, 하필이면 개울에 빠뜨리고 만 것이다. 돈 아까운 건 고사하고, 점방까지는 너무 멀다. 할머니는 필시 따지고 말 겨를이 없다고 판단하셨을 거다. 순전히 희미한 달빛에 의지한 채 치마를 걷어붙이고 더듬이질을 하셨다. 용케도 고놈을 찾아 도랑물에 몇 번 헹구시고, 다시 오물오물 입속에서 가시더니, 손주 입안에 쏘옥 넣어 주셨다. 울고불고 보채며 앙탈을 부리던 녀석은, 이내 들까불며 해맑게 웃었다. 까치걸음 종종거리며 원없이 십리사탕을 쪽쪽 빨면서….
아, 없어서 못 먹던 십리사탕은 흐드러지게 넘쳐나는데, 먼 길 진작 떠나신 할머니는 지금도 새벽마다 청수물 떠 놓고 비손하실까? 싱겁이 사촌처럼 촐랑촐랑 뚝방길 내달리던 고놈이 벌써 고희에 이르렀으니, 때 되면 깔 베고 삐비 뽑다 멱감고 놀던 방죽 아래 똘뚝길! 내가 속이 없는지 니 속이 헛헛한지……. 한가위 달이 남달리 둥두렷하다, 밤이 이슥하도록.

편집 : 박춘근 객원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