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여, 하늘이시여
무던하지만 지나치다. 그래서 남부끄럽다. 지난해 늦가을, 무랑 배추를 거둬들이고 밭에 가 보질 않았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실농군(實農軍)처럼 비친다면 답답하다. 고작해야 친구네 농장 한쪽에서 푸성귀 부쳐 먹는 재미로 밭에 나다닐 뿐이다.
사실, 지난해 12월 우리 하니가 표연(飄然)히 하늘로 돌아간 뒤, 곰처럼 겨울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 어디 가서 통울음 숨기지 않고 한 열흘 꺼이꺼이 울다 오면 눈물이 마르려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바깥나들이를 했다. 무슨 요량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다. 갑갑해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느닷없이 그냥 나섰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청아공원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내 안 같지 않다. 49재 때 보고 가지 못했다. 가면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아내를 어쩌겠는가. 고양시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결국 가좌동 밭으로 가고 있었다.
가다 보니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우중충한 날이다. 신작로처럼 다져진 농로 위로 흙구름이 나부끼고, 깡마른 파밭에서는 덩달아 먼지 용오름이 피어오른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 가뭄이 길어서일까? 이래저래 스산하다.
그래도 들녘은 풋풋하다. 농막을 지키던 강아지는 바람만 스쳐도 풀더미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꼬리를 살래살래 흔든다. 긴 여정을 준비하던 쇠기러기 떼는 지푸라기 흩날리는 들판에서 열병식을 하듯 줄지어 서서 개구리와 방개를 깨우고, 멧비둘기 서너 마리 전깃줄에 앉아 도란거린다.
대충대충 뿌려놓은 시금치랑 상추가 제법 파릇파릇하고, 양파랑 마늘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허옇게 말라죽은 파 이파리 새로 움파가 돋아 오르고, 방풍도 미나리도 묵은잎 사이사이 새잎을 봉곳이 드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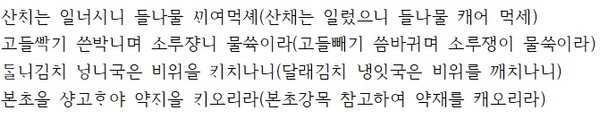
예나 지금이나 이맘때의 우리네 들녘은 온통 나물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들빼기를 비롯하여 씀바귀•소루쟁이•물쑥•달래•냉이는 심어 가꾸는 아이들이 아니다. 누구든지 맘만 내키면 아무데서나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봄나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냉이가 지천이다.
냉이가 어디 강답(강畓 :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곧 마르는 논), 골답(골畓 : 물이 흔하고 기름진 논) 골라가면서 자릴잡는가? 아니다. 냉이는 본디 ‘황무지 식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 팔도를 가리지 않는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갈라놓지 않는다.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I offer you my all)’는 꽃말처럼 골고루 사랑을 베푼다.
한배 아직 열지 않아 입술이 마르던 차에 / 未撥寒醅唇尙燥(미발한배순상조)
새로 돋은 봄나물 보니 눈이 번쩍 뜨이누나 / 忽看新菜眼還明(홀간신채안환명)
고려 시대 이곡(李穀)이 지은 가정집(稼亭集) 제17권 율시(律詩), ‘입춘(立春)에 회포를 적다’ 5~6행이다. 새로 돋은 봄나물에 아껴 둔 한배(寒醅 : 봄에 마시기 위해 겨울에 미리 담가 둔 술) 한 잔 곁들이는 풍미는 대단한 즐거움이었으리라. 그만큼 봄나물은 선비들도 기다리던 별미였다. 하지만 그렇다 할 푸성귀가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생명줄이요 보약이었다. 아무튼 조선왕조실록에는 기아의 참상이 시대별로 낱낱이 적혀 있다.
“사람들이 주려서 말의 사료를 훔쳐 먹기 때문에, 살진 말이 날로 파리하여져서….” (태종실록 : 1401.12.14.)
“기근이 더욱더 심하여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다가 개천과 구렁에 죽어 뒹구는 자가 4, 5백여 명에 이르옵고, 살아 있는 자도 무력하여서 비록 부자·형제라도 거두어 장사지내지 못하였사오며….” (세종실록 : 1443년 9월 22일)
“중원(中原)의 모든 지역은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이 초근목피를 거의 다 먹어 치웠고, 사람이라도 서로 잡아먹을 판국입니다.” (선조실록 : 1594년 6월 4일)
☛ ‘중원’은 삼국의 접경지로서, 우리나라의 중심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충주 일대를 말한다. 조선의 한복판에 세웠다는 중앙탑이 바로 그곳에 있다.
“선산부(善山府)의 한 여인은 그의 여남은 살 된 어린 아들이 이웃집에서 도둑질하였다 하여 물에 빠뜨려 죽이고, 또 한 여인은 서너 살 된 아이를 안고 가다가 갑자기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갔으며, 금산군(金山郡)의 굶주린 백성 한 사람이 죽을 먹이는 곳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의 아내는 옆에 있다가 먹던 죽을 다 먹고 나서야 곡하였습니다. 천성으로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죽음에 대한 슬픔이 먹을 때는 드러나지 않으니, 윤리가 딱 끊겼습니다.” (현종실록 : 1671년 4월 6일)
☛ 윗글은 경상 감사 민시중이 보고한 글로, ‘선산부’는 지금의 구미를 가리킨다.
임금은 이처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을 두고 “아, 오직 나의 부덕함이 진실로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니, 어찌 까닭이 없다고 하겠는가.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으니 백성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고 되묻는다. (정조실록 : 1783년 10월 29일)
한편, 조선 시대 학자 이수광은 1634년에 간행한 시문집, 지봉집 제3권에서 풀 한 포기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을 아래와 같이 읊었다.
병든 길손 여전히 칩거하고 있는데 / 病客仍成蟄(병객잉성칩)
봄빛이 슬그머니 사립에 들어왔네 / 春光暗入扉(춘광암입비)
황량한 방죽에는 안식조차 없고 / 荒陂無鴈食(황피무안식)
부서진 바람벽엔 우의만 남았구나 / 破壁有牛衣(파벽유우의)
☛ ‘안식(鴈食)’은 안선(鴈膳)과 같은 말로, 식용으로 쓰이는 줄 - 못이나 물가에서 자라는 볏과 식물 -의 열매인 고미(菰米)의 별칭으로, 기러기가 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다!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민중의 삶은 핍진(乏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랴. 초근목피는 차라리 과분했다. 똥구멍이 찢어지더라도 송기(松肌)나 송순(松筍)은 감지덕지하며 융숭하게 떠받들던 이들이 도처에 즐비했다. 남몰래 아이를 내다 버리는 일은 다반사요, 인육을 먹기까지 했으니 남편의 주검 앞에서 죽 그릇을 먼저 꿰차는 여인의 비극은 어쩌면 팔도의 일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아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비록 성은을 입어서 다행히 죽음을 면했지만, 거의 모두 조형곡면(鳥形鵠面)이라서 큰 병을 앓은 뒤에 막 병석에서 일어난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치평요람 제132권)
☛ ‘조형곡면’은 새의 형상과 고니의 얼굴이란 말로, 굶주린 나머지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갗이 핏기가 전혀 없다는 뜻
입에 풀칠할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할까? 상상하기조차 미안하다. 이곡 선생은 “부모는 자식을 팔고, 남편은 아내를 팔고, 주인은 하인을 팔 목적으로, 저자에 늘어놓고는 헐값으로 흥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개나 돼지만도 못한 짓이라고 할 것인데, 유사는 이런 일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가정집 제7권)
☛ ‘유사(有司)’는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이를 말한다.
이렇듯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근천지(飢饉荐至)에 주린 배를 채워 줄 것이 절실했으니, 거칠고 메마른 삶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풀때기였다. 이름하여 구황(救荒) 식품이다. 여기에서 “‘荒(황)’ 자는 ‘艹(풀 초)’ 자와 ‘亡(망할 망)’ 자, ‘川(내 천)’ 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亡(망)’ 자는 전쟁에서 패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망하다’나 ‘없다’라는 뜻이다. 여기에 ‘艹’ 자와 ‘川’자가 결합한 ‘荒’ 자는 풀 한 포기(艹) 물 한 모금(川)조차 없는(亡) 곳이라는 뜻이다.” (네이버 한자 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초본·목본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야생하는 구황 식물이 851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뽕잎 솔잎 송기 여뀌꽃 콩잎 콩깍지 메 뿌리 칡뿌리 삽주 뿌리 쑥 마름 백합 느티나무잎 팽나무잎 새삼 씨 소루쟁이 등이 그것이다. 오죽했으면 ‘99가지 나물 노래를 부를 줄 알면 3년 가뭄도 끄떡없다’는 말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나물타령’을 전수하기에 바빴을까.
문득 10여 년 전 ‘진흙쿠키(mud cookie)’로 대변되는 아이티의 참상이 삼삼하다. 진흙을 반죽해서 소금과 마가린을 섞어 햇볕에 말린 ‘흙과자’마저 사 먹을 수 없어서 군침만 삼키던 아이들…, 아, 우리네 아이들은 이미, 고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춘궁기에 그릇을 빚던 전단토(田丹土 : 붉은 흙)나 백점토(白粘土 : 흰 찰흙)까지도 떡이나 죽에 새알심처럼 만들어 먹이지 않았던가!

그즈음이면 모진 삭풍에 만물은 얼어붙고 역병까지 도졌다. 거듭 말하지만 냉이는 하찮은 풀때기가 아니었다. 동토의 반도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나물국과 미음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을 정도였으니, 진휼미(賑恤米)를 받으면서도 뒷날 관채(官債 : 관에 진 빚)가 두려워 불안에 떨던 백성이다. 관곡은 적고 굶주리는 자는 많다 보니 늘 영악한 무리가 우선이요, 숫백성은 뒷전이라 천신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냉이의 본새가 진휼 그 자체였다. 역병보다 무서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나없이 냉이에 명줄을 걸고 살아갔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까지 감싸주는 위안음식(Soul Food)인 셈이다.
하지만 외눈에 안질이라더니, 겨울 가뭄이라도 휘몰아치면 굶주림을 피해갈 자는 없었다. 온종일 호미질해도 풀 한 포기 보이지 않는 불모지다. 뼛속까지 사무친 가난은 ‘기아’가 ‘기아’를 낳고 팔도에 ‘기아’가 넘쳐났다. 즉,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주리다 보니(기아 : 飢餓), 남몰래 아이를 내다 버리는 일(기아 : 棄兒)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이이 따라 거리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기아 : 飢兒)가 속출한 것이다.
강바람과 맞서지 않는다.
결코 속살을 내비치지 않는다.
먼지로 뒤덮인 이파리는 찢기고 갈라진 채 너덜너덜하다.
이파리 한 장 한 장 방사형으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혹한을 견디기 위한 전략이다.
녹색 아니어도 추레하지 않다.
광합성을 줄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얼어붙은 이파리가 유난히 발그잡잡하다.
뿌리는 곧고 깊게 아래로아래로 내리뻗는다.
맵고 쏘고 얼얼하지만 깊은 단맛을 풍기는 이유다.
볼품없어 보이지만 홉뜨고 날 바라보는 눈빛이 번뜩거린다.
냉이를 ‘어머니의 마음(Mother’s Heart)‘이니, ’가난한 사람의 약국(Poor Man’s Pharmacy)‘으로 부르던 유럽인들도 속내는 다르지 않았나 보다.
오진 녀석들!
어지간히 눈 크게 뜨지 않으면 알아채기조차 쉽지 않다.
오로지 대지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결코 높은 하늘을 훔쳐보지 않는다.

병충해도 잠든 세상, 스트레스받을 일이 무언가? 그깟 추위쯤이야 아랑곳하지 않으니 겨울에 나온 움파는 다디달다. 아내가 몇 포기 뽑아 해물은 물론 웃고명 하나 없이 말 그대로 파전을 부쳤다. 냉이까지 곁들이니 아리고 쏘는 맛이 남다르다.
“잘 계셨어요?
~~~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
마침 한 잔 들이켜려던 참에 선배 한 분이 보낸 문자다. 기꺼이 날 사사(師事)하고, 자다가도 말벗을 자임하는 분이다. 무슨 암호문처럼 보이지만, 일 있을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처지다.
“그래요, 장산 형!
냉이꽃은 다시 피는데, 냉이 딸랑이 흔들면서 노닐던 손주는 온데간데없고, 속없는 놈은 냉이전에 막걸리나 들이키고…….”
모진 삶이다. 관 속에 누워 있는 아기 머리맡에 케이크를 두고 자장가를 부르던 어미와 아비, 그 뒤에서 둘을 부둥켜안고 통곡하던 할미, 미처 건네 주지 못한 생일 선물과 동화책, 장난감과 옷붙이와 카드를 들고 몸부림치던 외삼촌 외숙모 이모 고모, 그리고 먼 하늘 바라보다가 이내 더수기만 들썩이던 할애비…….
슬픔은 오롯이 남은 자의 몫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은가? 못 할 짓이다. 몹쓸 세상이다. 그 세상 등지고 떠날 수 없는 내가 한스럽다. 힘닿는 데까지 딸과 사위와 아내를 보듬어 주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벙긋거리는 둘째, 재원이랑 눈맞춤하고 놀아주어야 하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하필이면 에미 애비 결혼한 날 눈을 감고
니가 태어난 날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디야
세상살이 729일 만에 하늘로 돌아간 우리 하니!
얼빠진 강상죄인(綱常罪人)이라
얻다 대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니 목에 걸려 있던 마스크 매만지며
가슴 저미며 통음한들 널 다시 볼 수 있으랴!
하루에도 골백 번 지고도 남지!
꿈속에서라도 보듬고 어르고 잪지만
백날 천날 기다려도 넌 아니 보이고
둥 둥둥 둥개야, 둥개둥개 둥개야
머잖아 하삐 가면 하늘벌 뛰고
뒤따라 할미 가면 하늘내 넘고
하늘강에 나가 지는 해를 잡아 보자
하니 하니 하니야, 우리 하니야…….
하늘이여, 하늘이시여!
세상없이 사랑옵는 우리 하니,
길 잃은 어린 영혼 보듬어 주시고
되돌아올 수 없다면 뒤돌아보지 않도록 밝히 인도하소서.

<붙이는 말>
지난해 12월 이후 손을 놓고 지냈다. 방안퉁수처럼 거의 집안에서만 지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처음으로 바람을 쐰다고 밭에 다녀와서 탈고한 글이다. 묵혀 둔 글이다. 사사로운 감정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편집 : 박춘근 객원편집위원, 김미경 편집장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