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Path to Peace: Embracing Strategic Autonomy (summary attac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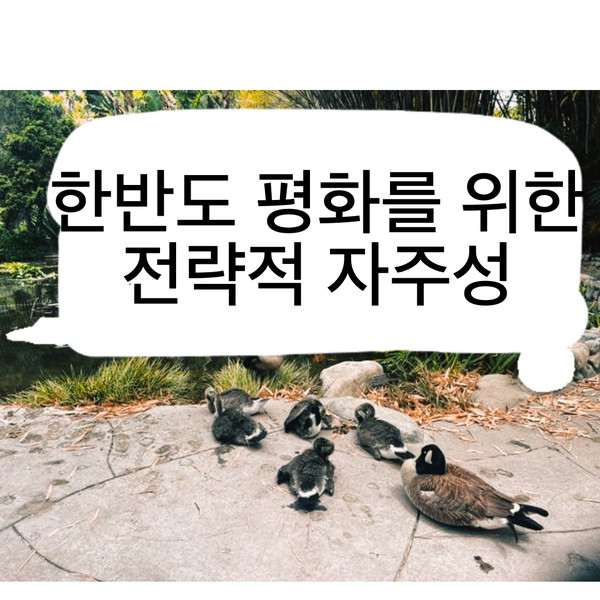
한국 국민에게 '중립국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외교 정책의 변화를 넘어선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성숙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 변화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중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립국 시민의식'이 담고 있는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가치들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칼럼은 한국 국민에게 필요한 시민의식을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제안하며, 그 본질과 함양 과정을 논한다.
'중립'을 넘어선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의 본질
'중립국 시민의식'은 외부 세력이나 이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국가의 안보와 유지를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며, 이상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익을 추구한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성 존중과 포용력을 발휘하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
이러한 가치들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면,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을 따라가는 식의 수동적인 중립을 넘어, 냉철한 국익 계산과 유연한 외교를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고차원의 능동적인 의식을 뜻한다.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국익을 최우선하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려는 **'균형 감각 시민의식'**과 직결된다.
또한, 외부 동맹에 대한 의존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공동체의 생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주체적 안보 시민의식의 의미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되, 이를 한국의 국익과 현실적 역량, 그리고 한국인의 심성에 맞춰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창의적 실용주의적 국제 시민의식'**의 발현이기도 하다.
한국 국민에게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와 그 도전 과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시민의식은 좌우 진영 논리에 갇히기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촉진하여 사회 내 이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국민이 특정 국가나 이념에 맹목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국가의 자율적인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면, 정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칠 주체적인 외교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외부 동맹에 대한 막연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위적 안보 역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블록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려는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도전 과제도 따른다. 오랜 기간 동맹에 의존해온 안보 환경에서 '전략적 자주' 지향은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심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를 강조할 경우, 미중 갈등과 같은 복잡한 국제 문제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자주'가 자칫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될 경우, 외교적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자주'로 오인하여,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도로 비칠 위험도 존재한다.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 함양의 필수 과정
한국 국민이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노선 변경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다층적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파랑색, 빨강색으로 갈라진 현 상황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한다. 알고리즘이 특정 틀에 가두는 매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의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감정적으로 소비하기보다, 현재의 외교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안보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 전환과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방력 강화와 안보 비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징병제 등 안보 의무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실용주의적 국익 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이념이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통합적이고 실용주의적 외교가 중립 외교의 핵심임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갈등 관리 역량 증진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 세대, 젠더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인에 대해 비난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내부적 합의 도출 능력이 전략적 자주 외교의 기반이 된다. 또한, 사회 내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는 교육과 공론의 장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심화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통해 국제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 다문화적 이해를 함양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민이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노선 변경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태도 전반에 걸친 **'내면의 독립'**에서 비롯된다. 맹목적인 지역 감정 및 이념이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냉철한 현실 인식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자주성'**을 향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복잡다단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핵심적인 길을 제시한다.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걸음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중립국을 향한 준비, 또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가능성을 넘어,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통한 중립국 지위 확보는 외부의 선언이나 조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내면의 독립'**을 전제로 한다.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독립을 함양하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이 의식은 국민이 특정 강대국이나 이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냉철한 국익 계산과 유연한 사고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고차원적인 능동성을 갖추도록 한다. 마치 개인이 감정적 굴레를 끊고 건강한 관계를 맺듯, 국민 개개인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는 사회 전반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외부의 압력이나 과거의 관성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회를 만든다.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중립국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한다. '중립'이 자칫 안보 공백이나 고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민의식을 통해 국민은 안보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게 된다.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국방력 강화 및 안보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무장 중립'을 표방하는 진정한 의미의 중립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또한, 실용주의적 국익 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념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외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면서도 국익을 확보하는 '창의적 실용주의적 국제 시민의식'의 토대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세대, 젠더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인에 대해 비난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갈등 관리 역량 증진과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내부적 합의 도출 능력이 강해질수록,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고 국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은 더욱 커진다.
결론적으로,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은 맹목적인 지역 감정이나 이념, 혹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냉철한 현실 인식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내면의 독립'**을 이뤄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릴 때, 한국은 외부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국가로서 복잡다단한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전략적 자주성'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중립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준비이자,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길러지는 주체적 역량과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전략적 자주 시민의식'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Condensed translation:
Korea's Path to Peace: Embracing Strategic Autonomy
by Vana Kim Hansen
I have been propposing a "neutral nation's civic consciousness" for Korea. It's not just about foreign policy but deep personal and societal change. Given Korea's unique context, "neutrality" can be misleading. This column proposes "strategic autonomy civic consciousness" as a vital new concept for Koreans.
This consciousness moves beyond political neutrality, fostering independent, proactive thinkingfor at the citizen level. It means reformatting the thinking of the Korean people based on national interest, employing flexible diplomacy, and embracing balanced perspectives on complex issues, and more. It emphasizes proactive security through self-reliance, not just alliances. Ultimately, it embodies a creative, pragmatic global civic consciousness that prioritizes universal values while upholding Korea's strengths. And more...
Cultivating this consciousness demands ongoing effort: moving beyond binary thinking, strengthening self-reliant security awareness, building consensus for pragmatic national interests, and improving conflict management from inside out. This requires continuous education and open public discourse, with transparent information and consistent leadership visions for the nation's long-term interest.
In essence, "strategic autonomy civic consciousness" fosters 'inner independence.' It involves shedding biases for clear-headed realism, flexible thinking, and global responsibility. As this takes root, Korea can achieve "strategic autonomy," securing lasting prosperity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le peace is cultivated internally, not granted externally.
Can this "strategic autonomy civic consciousness" truly take root in Korean society?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