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세종대왕(世宗大王) 때 병조판서까지 지내셨던 윤회(尹淮, 1380-1436) 선생의 일화입니다. 선생이 젊어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여관의 마당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집 아이가 진주를 가지고 나와서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마침 옆에 있던 거위가 달려와 이를 삼켰습니다. 얼마 후 진주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이 선생을 의심해 묶어두고는 내일 아침에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순순히 묶이면서 “저 거위도 옆에 같이 묶어두시오.” 했습니다. 아침에 거위가 똥을 싸자 진주가 나왔습니다. 주인은 사과하며 “왜 어제 사실대로 말을 안 했소?” 하니 선생은 “그랬다면 주인장께서 필시 거위를 죽일 것 같아서 참았지요.” 하였답니다. 이렇듯 거위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던 윤회 선생께서 <의부 임씨에 대해 하례하는 시집의 서문[賀義婦林氏詩序]>을 지으셨습니다. 이 글은 《동문선(東文選)》 93권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동방이 나라를 세운 시기는 중국의 도당씨(陶唐氏, 요(堯)임금)와 같은 시대였으며, 주(周)나라 때에 이르러 기자(箕子)가 이 땅에 봉(封)함을 받았으니, 어진 성현(聖賢)의 교화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더 깊어졌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조정의 여러 성군들이 서로 계승하여 교화를 밝히고 풍속을 순후하게 만들어, 집집마다 절의를 숭상하고 사람마다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돈독하였으니, 아무리 어리석은 필부필부(匹夫匹婦)일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를 ‘일반 백성들조차 옳고 그름을 알고,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예의를 갖춘 나라’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선생의 말씀처럼 ‘오랜 역사를 통해 길러진 맑고 착하고 올바른 심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단언합니다.
구고(九臯) 임씨(林氏)는 전의감 부정(典醫監副正) 임영순(林英順)의 따님이다. 성인이 된 뒤 현재 통례문 봉례랑(通禮門奉禮郞)인 박조(朴慥) 군에게 시집왔으며, 시어머니 전씨(田氏)를 섬기면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다. 건문(建文) 신사년(1401) 봄, 박군은 벼슬하러 서울에 가 있고 임씨 혼자 태인현(泰仁縣)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3월 10일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났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제 한 몸 구하기 바빴는데 시어머니만은 늙고 병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임씨가 급히 뛰어 들어가 시어머니를 안고 나오다가 섬돌에 걸려 그만 엎어졌다. 마침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불길이 성하게 일어나니 임씨는 자신의 몸으로 시어머니를 덮어서 가리느라 머리를 그슬리고 등을 데었다. 건장한 종이 이를 보고는 뛰어 들어가 불길을 막으면서 들쳐 업고 나오니 마침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한밤중에 일어난 불. 다른 이들은 재빨리 대피할 수 있었지만 늙고 병든 시어머니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훨훨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며느리의 그림자. 어찌어찌 시어머니를 안고 나오다가 그만 힘이 부쳐 엎어지고 맙니다. 불길이 두 사람을 덮칠 때 뒤늦게 노복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무사히 구해 냅니다. 모두들 환호하며 열렬히 박수를 보냅니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며느리가 불길로 뛰어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머니 구하지 않았다고 쏟아질 비난?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그 순간 며느리를 움직이게 한 것은 ‘맑고 착하고 올바른 심성,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머 저걸 어째, 저 불길에 노인이 얼마나 뜨거우실까.” 그래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불길 속으로 저렇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임금께서는 그 집에 정문(旌門)을 세우고 의부(義婦)라고 일컫도록 명하면서, 조정의 사대부들에게 시를 지어 이를 찬양하라고 하셨다는군요. 그대들도 보고 좀 배우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글의 제목이 <의부 임씨에 대해 하례하는 시집의 서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글의 마무리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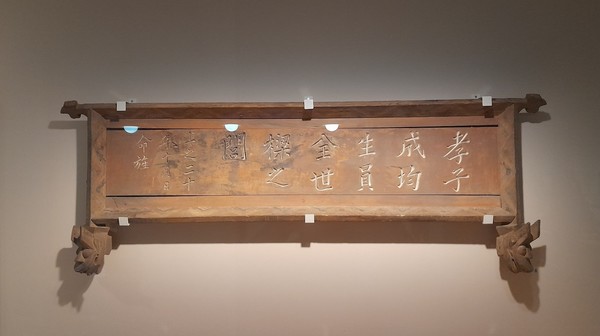
내가 생각하건대, 임씨는 일개 부인일 뿐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여 갈고 닦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면에 쌓였으며, 남편을 잘 섬기면서 평소에 보고 느낀 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위급한 순간에 오직 구하겠다는 일념을 발동하여 의연하게 뜨거운 불길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 순간에는 오직 시어머니 구해 내는 것만을 급하게 여겼지 자기 몸이 위태롭게 되어 죽게 될 것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것이 아무리 천성의 참된 바탕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우리 거룩한 조정에서 은덕으로 백성을 길러 주면서 풍속의 교화에 힘쓴 결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是雖本於天性之眞, 何莫非我盛朝涵濡喣育, 以礪風化之致然歟?]
|
*涵 젖을 함 *濡 젖을 유 *喣 불 후 *礪 숫돌 려 |
임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길러지고 각인된 맑고 착하고 올바른 심성’으로 저토록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나라의 총체적인 위기, 그 혼란과 격변의 현장에서도 국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낸 주인공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민족. 그 민족이 계속 위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편집 : 조경구 객원편집위원. 조형식 편집위원
|
※ 《동문선(東文選)》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지어진 우수 작품을 모은 선집이며, 이미 번역되어 한국고전종합DB에 올라 있는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귀한 내 것을 내 것인 줄 모르고 쓰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됩니다. 이 코너는 《동문선》에 실린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잊을 뻔했던 내 것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메인사진 기사더보기
- [동문선 읽기 059] 기괴함과 새로움
- [동문선 읽기 058] 나 아직 안 죽었어
- [동문선 읽기 057] 글쓰기는 어려워
- [동문선 읽기 056] 보고 싶다
- [동문선 읽기 054] 숨은 그림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