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헨리 제임스의 <아메리칸>(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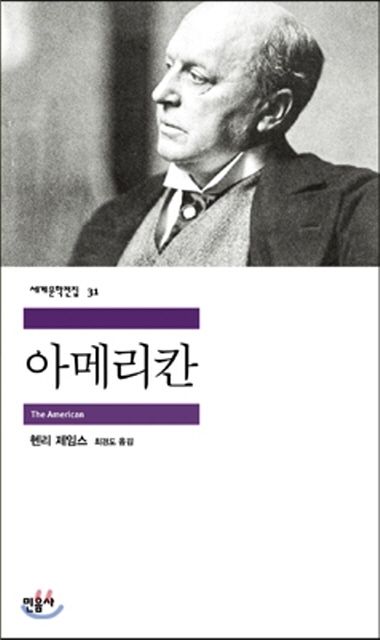
대체 나를 나이게 하는 문화 유전자로서의 정체성identity이란 무엇인가?
서양문학사와 문예이론서를 들추먼 자주 언급되는 터여서 좀 낯설었지만 용기를 내 헨리 제임스의 장편을 읽어보았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대체 난 서구의 문명과 철학, 그리고 문체양식mode of style에 대한 개서를 늘 꿈꾸고 있었으니 이기지 모할 무모한 꿈인줄 알먼서도 뱃사공처럼 꾸준히 노를 저어 왔다.
그러다가 나는 어느 순간에 서구의 세계를 저 지브롤터 해협의 두 기둥처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두 기둥으로 하는, 시와 소설이라는 두 형식의 길항stand against의 역사로, 문체사로 볼 수 있것다는 과학적 직관을 갖게 되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니체의 '영원회귀'와 통하는 개념이고, 저 푸코의 '에피스테메'와 어울리며, 철학의 갓돌 들뢰즈의 저 '차이와 반복'과도 상통하는 개념이 아니것는가!
뭐 국제 소설이랄까. 여기, 제임스의 이 <아메리칸> 또한 그런 오랜 내력을 지닌 주제가 아니었던가! 나는 이 작품을 읽으먼서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랴.
무릇 소설은, 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비롯된 장사꾼의 언어임에 틀림없으렸다. 왜냐하먼 이야기는 쿤데라의 말대로 앎을, 지식을 그 모럴로 하는 것인데 이 지식은 바로 저 베이컨식 경험의 위대한 일반화로, 이것은 과연 저 프레드릭 제임슨(<맑스주의와 형식>, 창비)의 말대로 바깥세계와 인간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근대의 소설>을 일컬어 <부르주아의 승리의 서사>라 하는데 이게 사실 쉽게 말하먼 가벼운 봇짐장수로부터 현대의 오디쎄우스, 로빈슨 크루소는 무론, 저 지중해의 노략질, 해적질에 가까운 그리스 상단을 운영했던 자본주에 이르기까지 장똘뱅이들의 삶에 무슨 단 약가루처럼 재미진 이야기에 속임수를 섞은 그럼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신기한novel 요소가 있기도 하고 믿기 힘든 면fiction이 있는가 하먼 나 또한 겪어보고 싶은 꿈과 낭만roman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웅적인 에토스를 지닌 찬사조의 서사시와는 달리, 본래 그 '소설'이 가리키는 바 그대로 찌질한 개인의,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어찌되었든간에 이야기라는 서사적 형식을 통해 우리는 시상사를 알 수 있게 되었거니와, 이 시상사라는 게 잘 보먼 짐작하는 일이지만 돌고 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저 <삼국지> 의 서두에서 합구면 필분이요 분구먼 필합이란 구절과도 통하는 것이니 서양의 역사와 철학, 양식도 예외는 아닐 것인즉 여기, 합과 분, 분과 합을 상징하는 철학자가 귀족과 시를 옹호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부르주아와 소설을 편애한 플라톤이라 보는 게 나의 기본 전제다.
자, 그렇다먼 <아메리칸>은 또 어떤가. 여기, 어둠 속에서 금덩이처럼 반짝이는 진실을 마주해 보자.
"우리의 견해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가 반대하는 건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내력이죠. 실제 우리는 장사치와 어울릴 수 없답니다" 노 벨가드 부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난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소" 뉴만이 말했다.
"마음대로 하구료! 하지만 그 애가 당신을 만나기조차 거부하면 - 아마도 그럴 테지만 - 당신 지조는 그야말로 플라토닉하게 되겠지요."
자, 여기 소설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을 정리해보먼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 귀족과 부르주아 간에는 뿌리깊은 애증관계가 박혀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이것을 계보학적으로 정리해 보먼 다음과 같지 않을까. 특히, 가톨릭 국가 프랑스의 귀족인 노 벨가드 부인의 '플라토닉'이라는 언급에서 오랜 내력을 지닌 귀족의 옹호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싸늘하고 오만한, 그 적의에 찬 눈길을 확인하게 된다.
귀족(상원)과 부르주아(하원)
가문의 내력이냐 개인의 성격이냐
명예냐 실제냐
시냐 소설이냐
신이냐 인간이냐
아리스토텔레스냐 플라톤이냐
프랑스냐 미국이냐
남방문학이냐 북방문학이냐
리세냐 아카데미냐
보편이냐 개별이냐
구대륙이냐 신대륙이냐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호메로스냐 오시안이냐
예술의 신이냐 시장의 신이냐
정오의 시간이냐 황혼의 시간이냐
......
그러니까 <아메리칸>은 실용주의의 나라 미국인이 겪은 허세주의의 나라 프랑스의 이야기를 밑감으로 하고 있다. 읽어보먼 알것지만 나는 이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역시 소설은 앎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허세는 수탉으로도 상징되거니와 화려한 말발, 글발, 밤거리 건축 예술 등 머 을마든지 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그림같은 귀족 가문의 여인 싱트레 부인이 있다. 이 여신 같이도 아름다운 귀족 가문의 여인을 돈 많은 미국의 사업가 뉴먼이 어떻게 해 보려다 보기좋게 쓴잔을 마신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티피컬한 사례로 미국과 프랑스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미국적 가치와 프랑스적 가치로 상징되고 있거니와, 이것은 그리스 이래 오랜 내력을 지닌 서구적 문화에 바탕하고 있다는 데에 이 소설의 깊이와 말로 다할 수 없는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 백만장자 미국인 사업가 뉴먼은 라틴계 가톨릭의 귀족가문이 무엇을 그 기본 모럴로 하는지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물코를 흘렸으니, 귀족들은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존심을 지닌 그레코 로만 가톨릭의 후예들이 아닌가! 그러니 북부 개신교의 나라에서 온 백만장자가 돈을 앞세워 모든 것을 제맘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덤벼들었으니, 머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참 훌륭한 반면교과서가 아닐 수 없다. 이 세계에는 머 그것은 관우와 조조에게도 해당되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기는 하지만 '명예'를 존중하는 고귀한holy 아킬레우스적 세계와 더불어 '실제'를 중시하는 영리한canny 오디쎄우스적 세계가 공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첫째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냐 플라톤이냐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둘째요, 양식적으로 시냐 소설이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또한 그렇지 않것는가. 왜냐하먼 귀족은 노래를, 자신에 대한 시적 찬사를 원하지만 부르주아 장사치는 자신의 성공서사를, 끝없는 모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영국적 유명론을 상징하는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 경험론 철학자 베이컨은 왜 그렇게도 집요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까 대는지... 미국 대학의 교양 첫 강의가 왜 시인추방론의 원조 플라톤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영국 철학의 아주 특이한 그리스적 성격, 그 경험론적 신플라톤주의'(들뢰즈, 가타리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니... 이게 어찌 모다 우연이것는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왜 호메로스(남방문학)로 시작되었다가 오시안(북방문학)으로 끝나고 있는가...
아, 씨파! 소설이 이렇게 재미지다니... 읽는 내내 지적 케미가 나를 휘감았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읽었다
*원문은 <철학자 김수영>(사실과가치)의 부록에도 들어있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양성숙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