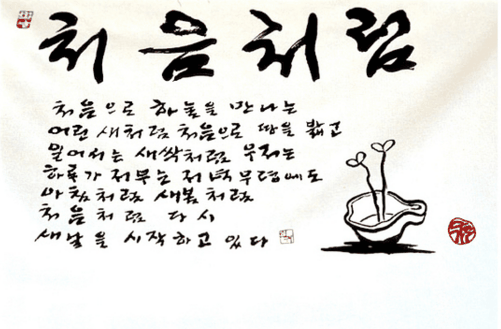
향원, 오랜만에 필을 드오. 그간 카톡을 통해 우린 그때그때의 심경을 서로 주고받았으나 제약된 공간 속에서 긴 얘기 나누지 못했소. 우선 그동안 사랑 속에 보내 주신 좋은 글과 노래에 감사하오. 지난 한해 당신이 있어 난 행복 했소. 다시금 감사드리오.
향원, 오늘은 신영복 교수의 장례 날이요. 난 신교수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오. 다만 그가 우리와 같은 연배로 서울 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 그 뒤 숙명여대와 육사에서 경제학 강의, 1968년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1988년 특사로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하오. 이후 성공회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진보성향 사람이란 정도로 그 분에 대한 단편적 정보만 알고 있소. 다만 2004년 돌베개에서 발간된 그의 저서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을 통해 그의 해박한 지식과 명징한 자기 성찰, 그리고 깊은 사유를 넘볼 수 있었소.
그러다 난 작년 밴쿠버 갈 때 그의 마지막 저서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를 들고 가 읽고 난 뒤 비로소 그의 인문학적 소양이 20년의 감옥 생활에서 얻어진 것이란 걸 알았소. 참으로 엄청난 사유(思惟)였소. 다산의 강진 유배가 18년이란 이란 걸 생각하면 그 보다 2년이나 더했구려.
향원도 지난 언젠가 나와의 대화 글에서 신교수의 책을 읽었다 했죠. 나도 고전을 탐독한 사람으로서 신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했소. 예컨대 <논어>의 '和而不同', <주역>의 '碩果不食' 등이 그것이요. "言約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처음처럼", "더불어" 등의 많은 화두가 모두 그의 감옥 생활에서 얻어졌더군요.

향원, 그는 <담론>에서 '공부'는 단순한 앎의 지식이아니라 '깨달음'이라 하면서 이 깨달음의 공부가 살아가는 이유라 했소. 때문에 "공부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의 존재형식"이라 했소.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성찰이며, 그것을 토대로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실천이라고 했소. 그런 '세상바꾸기'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인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변방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도 했소. 그리고 "존재로부터 관계로 나아가는 탈근대담론"을 그 무기로 벼렸더군요. 기존 중심부를 변방으로서 바꾸는 전환(tuning) 논리는 쿤의 패러다임을 연상케 했으며, 관계 중시는 시스템론을 상기 시켰소. 그런 그의 사유가 가능했던 것은 감옥 속에서 읽은 동양고전 때문이었소.
그는 <논어>의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를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며 공존하지 못한다"고 읽었더군요. 또 <주역>의 '山地剝'괘에 나오는 "碩果不食'(씨과일은 먹지 않는다)을 "절망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람을 키워내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자고 했소. 그러면서 가을철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감을 '碩果'라 하면서 이를 통해 그는 '葉落', '體露', '糞本'을 통찰했더군요. 즉 낙엽인 엽락(葉落)은 환상과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고, 나목(裸木)의 체로(體露)는 뼈대와 구조로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부심이며, 뿌리거름인 분본(糞本)은 낙엽이 뿌리를 따듯하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했더군요.
끝으로 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가치의 하위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입니다. ...(중략)... 욕망과 소유의 거품, 성장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그 근본에서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뼈대를 튼튼히 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이 석과불식의 교훈이고 희망의 언어입니다"라고 강조했소.
사형수로 미래를 놓고도 옥중에서 청구회원들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의 의지가 바로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라"로 표현됐더군요. 그의 언약이 강물처럼 흘러 언젠가 만남으로 꽃피워 질 것이라 믿소.
향원, 날씨가 쌀쌀하오. 신교수의 장례식을 보며 많은 생각이 떠 올렸소.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건데...
"올 때는 흰구름 따라오고(来與白雲来), 갈 때는 밝은달 쫒아가네(去隨明月去)
오고가는 주인공(来去一主人), 필경엔 어느 곳에 있는고?(畢竟在何處)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만 줄이오. '여럿이, 함께!'
2016. 1. 18. 김포 허산 자락 귀락당 낙우재에서 한송 포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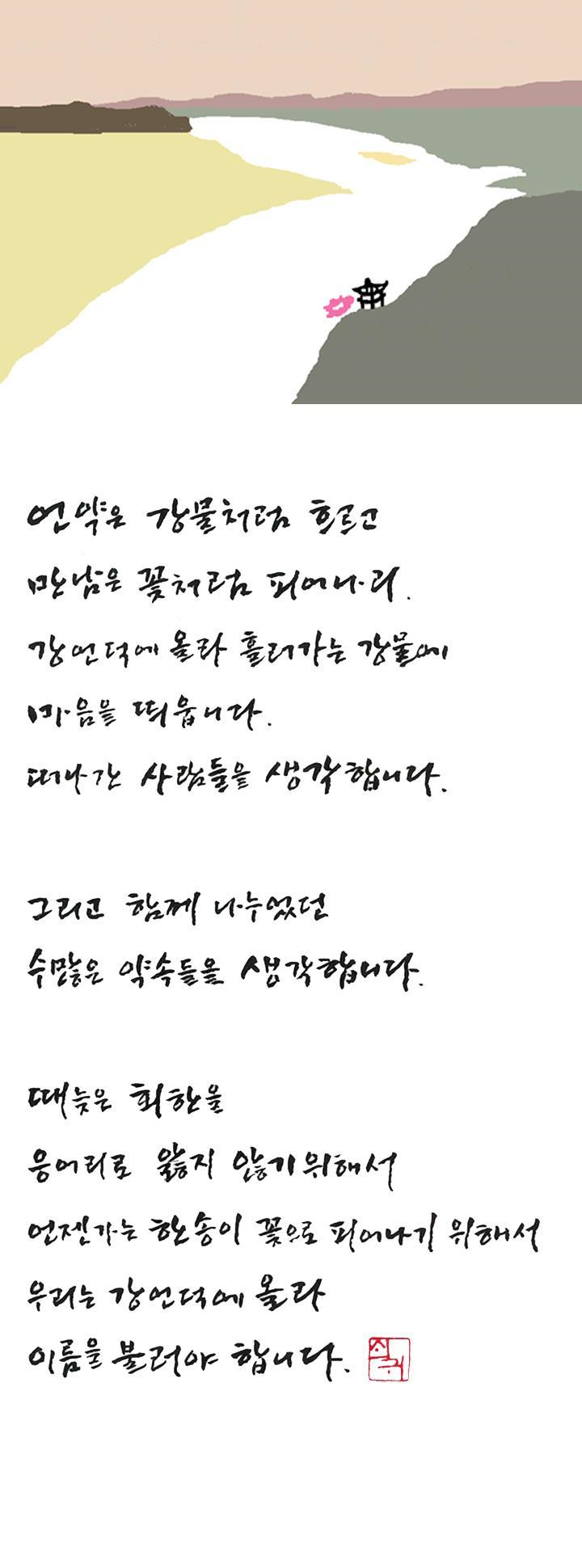
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정우열의 <여안당 일기> 기사더보기
- <여안당 일기> 동생, 밥 먹었어?
- <밴쿠버 일기> 달빛이 뜨락에 가득한데...
- <밴쿠버 일기> 린밸리 공원에서 하루를 즐기다
- 석과불식(碩果不食)-신영복 교수의 서거 소식을 듣고
- 봉사하는 즐거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