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눈이 펄펄 내린다.
함박눈이다.
테라스로 올라갔다.
앞 모담산에도 뒤 강변에도 눈이 하얗게 쌓였다.
장독 앞 눈 위에 '사랑' 이란 두 글자를 써놓고 내려왔다.

한데, 왜 그리 가슴이 두근거릴까? 두근대는 가슴을 달랠 길 없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은 여전히 내린다. 발걸음을 강변 쪽으로 옮겼다. 나무마다 눈꽃(상고대)으로 장관이다.

얼마쯤 가다 뒤를 돌아보니 걸어온 내 발자국이 길게 꾸불꾸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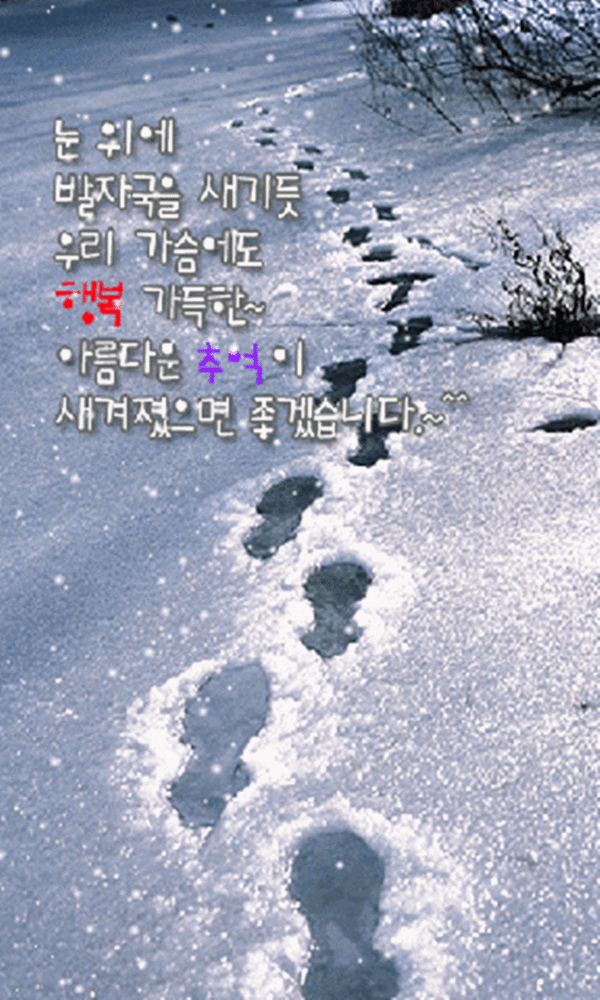
문득,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시가 떠올랐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가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길(이정표)이 될지니.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하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서산대사의 시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선비 이량연(李亮淵, 1771~1853)의 시라 한다.
穿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朝我行跡
遂作後人程
내용은 같으나 글자가 몇 군데가 다를 뿐이다. 즉 '穿'이 '踏', '朝'가 '日'로 바뀌었다.
이 시는 독립운동가 김구(金九, 1871~1949) 선생도 당신의 좌우명처럼 즐겼다고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여민관(與民館)에 이 시를 액자로 걸어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데,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 그것은 메시지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뒷사람의 이정표(里程標)!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느끼며 강변길을 걸었다.
멀리 강 건너 심학산(尋鶴山)을 바라보니 한 폭의 동양화다. 다시 전류리(顚流里) 쪽을 바라보니 어부가 눈 속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바로 유종원(柳宗元, 773~819)이 읊은 시, '江雪'(강가에 내리는 눈) 그대로다.
千山鳥飛絶
萬逕人踪滅
孤舟簑笠翁
獨釣寒江雪
산이란 산에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엔 사람 자취 끊어졌는데,
외로운 배에는 도롱이와 삿갓 쓴 늙은이가
홀로 낚시질하고 있다. 추운 강가에는 눈만 내리는데...
한 폭의 그림을 보는듯하다. 한 늙은이가 외로이 강 가운데 배 띄우고 낚시질한다고 했다. 고기를 낚는 것일까? 눈을 낚는 것일까? 아니면 세월을 낚는 것일까? 강태공의 낚시 말이다.
유종원은 당송(唐宋) 8 대가의 한 사람으로 이 시 '江雪'은 유종원이 영주 사마로 좌천 되어 갔을 때 억울하고 외로운 감정을 달래기 위해 읊은 것이다. 굴원(屈原)이 '漁父辭'를 읊은 것처럼...
나는 5년 전 김포 이곳 하늘빛 마을(雲陽洞)로 이사 온 뒤로 자주 강변을 걸으며 굴원의 어부사를 읊는다. 한데, 오늘은 유종원의 '江雪'을 읊으며 두근대는 가슴을 달랬다.
이 시는 유종원의 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눈은 여전히 내린다. 이때 구름도 머물러 간다는 운류산(雲留山) 용화사(龍華寺) 저녁 종소리가 눈 속에 들려온다.
발길을 나의 집 여안당(與雁堂)으로 돌렸다. 아내 한솔과 함께 하던 집이다. 2월 14일이면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4년이 된다.
"여보! 나 강변 한 바퀴 돌고 왔어!"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당신 테라스 장독 앞 눈 위에 '사랑' 두 글자 써놓고 나갔지? 내가 다 봤어요. 고마워!" 한다.
오늘따라 아내가 몹시 그립다.
2023. 1. 28.
김포 여안당에서
눈 내리던 날 아내를 그리워하며 한송 쓰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정우열의 <여안당 일기> 기사더보기
- <여안당 일기> - 의로움을 잊고 오로지 이익만 챙긴다 -
- <여안당 일기> - 누가 북쪽을 붉다 하는가?-
- <여안당일기> - 삼국의 여인들, 새로운 세계를 열다-
- <여안당 일기>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 <여안당 일기> -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